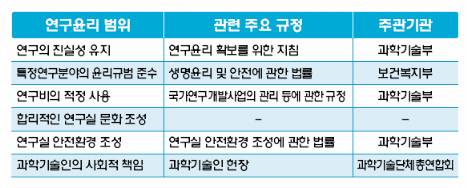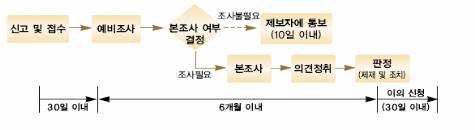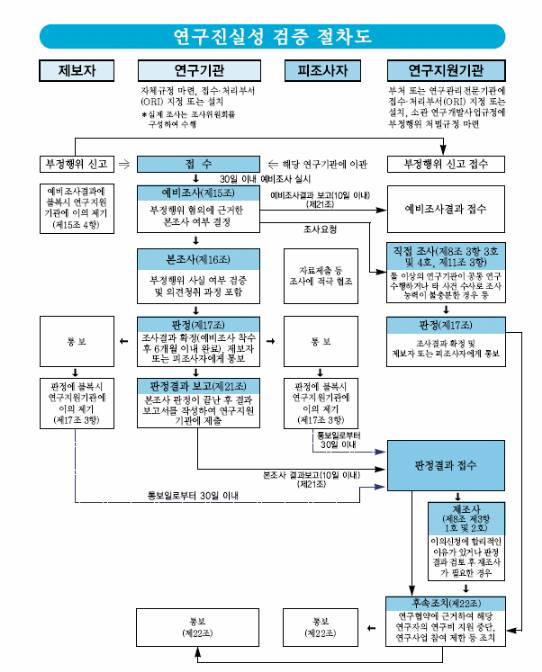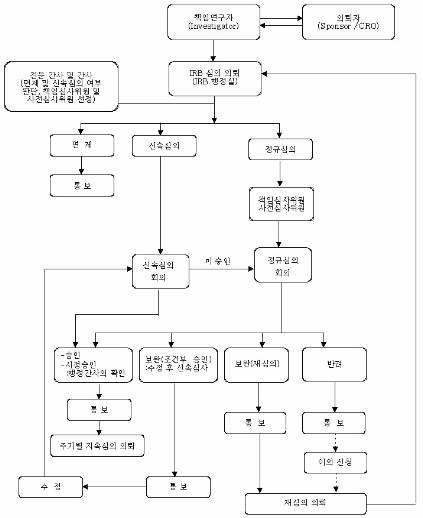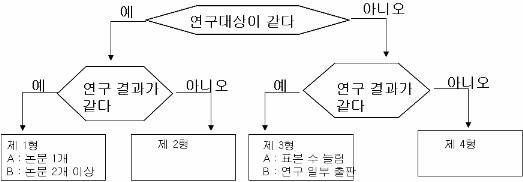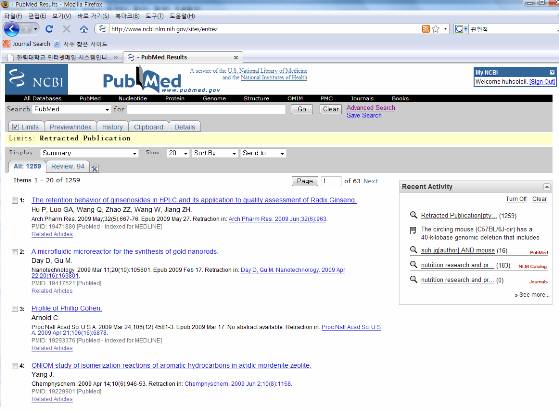교원 대상 올바른 연구 실천 팀바탕학습
김수영⦁서준교⦁주영수⦁허선⦁황인홍
Team-Based
Learning on Good Research Practice for Faculties
Soo Young Kim, Jun-Gyo Suh, Young-Su Ju, Sun Huh, Inhong
Hwang
XMLARCHIVE
Masthead
Author: Soo Young Kim, Young-Su Ju,
Jun-Gyo Suh, Sun Huh, Inhong Hwang
Editor: Soo Young Kim and Young-Su Ju
Published by XMLARCHIVE, Chuncheon,
Republic of Korea
On June 13, 2009
Copyright statements
© 2009, XMLARCHIVES
 Creative
Commons License
Creative
Commons License
First published 2009 by XMLARCHIVE
1 2009
National Library of Republic of Korea Cataloging-in-Publication Data
Soo Young Kim, Young-Su Ju, Jun-Gyo
Suh,
Sun Huh, Inhong Hwang
Team-based learning on Good Research Practice for
Faculties
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s.
ISBN-13: 978-89-962637-1-5 [pbk: alk. paper]
1.
Research ethics
2.
Publication ethics
3.
Team-based learning
⦁Printed and bound in Republic of Korea
⦁Publication of this book i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from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07-Research Ethics-Ga-002) for Chapters 1, 2, 4-9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8-Research
Ethics-Ga-004), Republic of Korea for Chapters 3 and
10.
⦁This book is printed on acid-free paper.
교원 대상 올바른 연구 실천
팀바탕학습
Team-Based
Learning on Good Research Practice for Faculties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서준교
한림의대 의학유전학교실 교수
주영수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부교수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교실 교수
황인홍
한림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XMLARCHIVE
목적,
범위, 독자 및 이해관계
Aims, Scope,
Readers and conflict of interest
목적 및 범위: 대학 교원이 Team-based learning을 통하여 올바른 연구 실천에 대한 강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 및 출판 윤리를 다룬다.
예상 독자: 전 학문 분야에 연구 및 출판 윤리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즉 편집인, 편집위원, 발행인, 원고편집인(manuscript editor), 통계 편집인(statistical editor),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연구자, 대학이나 기관의 연구 담당 직원, 기관윤리위원회 위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 임상시험 담당자,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회사 직원, 실험동물 생산자, 과학 담당 기자 및 모든 학문 분야 대학원생 등이다.
독해 수준: 일반인을 위한 것은 아니고 매우 전문적인 분야의 내용이므로, 최소 연구를 하고, 논문을 투고하거나 심사하여 본 적이 있거나 연구 및 학술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어야 이해할 수 있다.
한계: 이 책에서 기술한 내용은 최선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이것이 모두가 아니므로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참고 문헌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책에 기술한 내용은
저자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나열한 것이므로 다른 정보가 있다고 하여 그 정보를 기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Conflict of Interest: 이 책에 나오는 어떠한 기관과도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예상 독해 시간: 최소 1 시간 최대 5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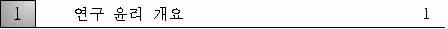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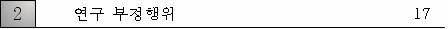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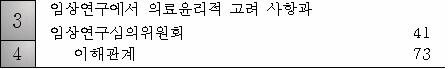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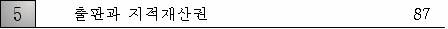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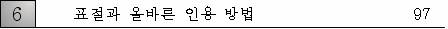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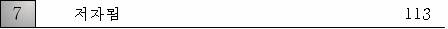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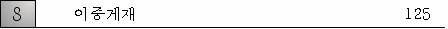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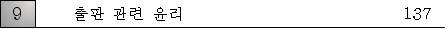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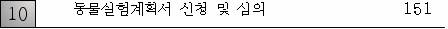
연구 윤리 개요
Introduction to research ethics
☞ 학습목표
연구 윤리의 개념과 영역 그리고 책임 있는 연구 활동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 구체적 학습목표
1. 연구 윤리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한다.
2. 연구 윤리, 연구 진실성, 책임 있는 연구 활동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3. 연구 윤리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한다.
4. 우리나라 정부 법령, 기관의 정책, 전문가 단체 등에 있는 책임 있는 연구 활동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가. 서론 : 용어, 역사
연구 활동의 기본은 신뢰와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다른 연구자들이 발표한 보고 결과의 타당성이나 정직성을 의심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학술적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다. 또한 장비가 첨단화 하고 연구 규모가 대형화하고 분업화하기 때문에 연구자들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이 경우 연구자 상호간 신뢰와 존중이 없으면 그러한 협력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뢰는 연구자들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 활동(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을 할 때에만 유지 된다.
책임 있는 연구 활동이란 다음과 같은 가치 기준에 의거해 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1) 정직성: 정직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공약을 존중하는 것
(2) 정확성: 연구결과를 정밀하게 보고하고 오류를 피하도록 주의하는 것
(3) 효율성: 연구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낭비를 막는 것. 연구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4) 객관성: 사실만을 기술하며 부적절한 비뚤림(bias)을 피한다.
객관성이나 효율성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요소가 부족하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다. 또한 객관성이나 효율성의 결여는 대부분 의도적이지 않으며 잘 짜인 교육 활동이나 편집 과정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제거될 수 있다. 잘못된 발견이나 결과의 잘못된 해석과 같이 정확성이 결핍된 것은 대부분 의도적이지 않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는 비록 의도적이지 않다고 해도 수정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정직성의 결여는 매우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사실의 추구하는 과학의 일차적인 목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책임 있는 연구의 수행 중 연구 진실성이 책임 있는 연구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이란 의미는 최소한의 의미로 사용된다면 연구에서의 부정행위가 없는 정확하고 정직한 연구의 계획, 수행, 발표를 의미한다. 넓게는 연구자가 지켜야할 과학적,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포괄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진실성이란 연구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부주의나 잘못된 지식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인 오류나, 위조, 변조, 표절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객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것을 의미하며 더 넓게 파악하면 차후에 연구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연구과정에서 발견 하거나 도출한 각종 아이디어, 연구방법, 데이터 및 현상들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일정기간 동안 충실히 보관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연구 윤리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바람직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윤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진실성을 유지하고 생명윤리 등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규범을 준수 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연구진실성은 연구윤리 문제이기도 하나, 연구윤리가 곧 연구진실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진실성은 연구윤리의 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중 전범국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자행된 반인권적인 인체실험에 대한 교훈으로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상 최초의 의학 연구 윤리 기준인 뉘른베르크 강령이 발표(1947)되었으며, 이후 헬싱키 선언 (1964) 등을 거치면서 생명의료연구 윤리에 관한 논의가 더욱 구체화되었다. 또한 20세기 중반 이후 과학기술의 산업화 및 연구 환경의 경쟁 심화 등에 따른 연구윤리의 변질과 연구 부정행위 증가 등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되면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성 및 연구진실성 확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대두되었다.3)
나. 연구윤리의 범위
연구 윤리에는 어떠한 영역이 있고 어떠한 범주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되어 있지는 않다. 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에는 이를 아래와 같은 1) 과학 연구에서의 진실성, 2) 논문 저자 표시 등 공로배분의 공정성, 3) 연구실 문화의 민주성, 4) 특정 연구 대상이나 연구 방법에서의 윤리성, 5)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성의 5가지로 분류한다.3)
1) 과학 연구에서의 진실성
과학연구의 전 과정에서 속임수, 부주의, 자기기만 등으로 인해 정확성과 객관성에 결함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연구 환경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론, 데이터 혹은 결과물 등에 대한 위조, 변조, 표절(Fabrication,
Falsification and Plagiarism)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 논문저자 표시 등 공로배분의 공정성
과학 활동에서 가장 큰 부분인 논문 발표에 연구 참여자간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공로를 합당하게 배분하였는지에 관한 것으로 대학원생이나 박사후 과정 학생과 같은 소장 연구자들에 대한 정당한 공로 인정 문제와,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원로 과학자나 상급자를 단지 예우 차원에서 논문저자로 올리는 문제(명예저자 표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3) 연구실 문화의 민주성
대부분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연구실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구 경에 관한 문제로서 지도교수와 대학원생(mentor-mentee)의 관계,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소통구조의 장애, 이용자원(연구비 및 실험재료 등)의 공평한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한다.
4) 특정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에서의 윤리성
생물학, 의학, 심리학 등의 연구 분야에 주로 적용되는 문제로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분야는 인체 대상 실험과 동물 실험 등 생명윤리에 관한 사안이다. 또한 향후 정보통신, 나노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특정 연구 분야에서의 윤리적 쟁점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5)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 일반과의 관계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행동하였는지와 관련된 문제로서 공공으로부터 조달된 연구비를 적합한 용도대로 집행하는 문제, 공익성에 반하는 산업 및 군사 연구에 종사하는 문제, 사회 전체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문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미국의 연구 윤리 관련 공식 기구인 Office of Research Integrity(ORI)에서 발간한 “책임 있는 연구 입문서(Introduction to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는 연구 윤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것을 다루고 있다.
|
제 1 부 : 공동의 가치
- 책임 있는
연구를 위한
규칙
- 연구 부정
제 2 부 : 연구 계획
- 실험 대상으로서
인간의 보호
- 실험용 동물의
복지
- 이해관계
제 3 부 : 연구의 수행
- 데이터의 관리
- 멘토와
훈련생의 책임
- 공동 연구
제 4 부 : 연구 보고와
연구 심사
- 저자와 발표
- 동료 심사
|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COPE)는 연구 윤리 내용 중 다음에 대해서 정의와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1 Study design and ethical approval
2 Data analysis
3 Authorship
4 Conflicts of interest
5. Peer review
6. Plagiarism
7. Duties of editors
8. Media relations
9. Dealing of misconduct
|
다. 책임 있는 혹은 바람직한 연구 행위
세계에서 최초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한 미국은 본인의 연구 활동에서의 진실성 확보는 물론, 이를 통해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오도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책임 있는 연구행위(Responsible Research Conduct)’를 강조한다.
책임 있는 연구 행위는 전문적 영역에서 발휘되는 좋은 시민 정신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연구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최선의 관행을 터득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무책임한 연구 활동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내용과 결과의 진실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조, 변조, 표절(FFP)만을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명확한 책임성 구분의 필요성은 사법체계를 통한 문제해결이 발달한 미국의 공판중심주의의 산물이기도 하다.
반면, 유럽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적발·처벌을 넘어서 정직하고 합리적이며 자율적인 연구풍토의 조성을 이상향으로 간주하여 ‘바람직한 과학연구 실천(Good Scientific Practice)’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바람직한 연구 활동’에 대한 시각과 기준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부정행위에 저자표시나 타인과의 공동연구에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되는 등 미국에 비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가 보다 포괄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바람직한 연구 활동 및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의 수준이 아직 초기단계이다. 따라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부정행위를 지양하면서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연구 활동이나 연구윤리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차원에서 본 지침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유럽형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3)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과학적 탐구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방법도 없다. 책임 있는 연구 행위 혹은 바람직한 연구 행위로 인정되는 관행들은 학문별 혹은 실험실별로 다를 수 있으며 실제로 다르다. 하지만 이를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 정직성: 정직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공약을
존중하는 것
• 정확성: 연구결과를 정밀하게
보고하고 오류를
피하도록 주의하는
것
• 효율성: 연구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낭비를
막는 것. 연구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 객관성: 사실만을 기술하며
부적절한 비뚤림(bias)을 피한다.
|
연구를 어떠한 관행이나 원칙에 따라 행하여야 하는가가 결국 책임 있는 연구 행위 혹은 바람직한 연구 행위의 기초가 될 것이며 이는 일반 대중이나 동료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상당히 복잡할 수 있고 명백히 정의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점에 대해서 ORI는 책임 있는 연구자와 책임 있는 운전자를 비교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책임 있는 운전에 대한 원칙이나 사회의 기대는 비교적 명확하다. 이는 법규와 문서화된 규칙을 통해 명백히 정의되어있지만 하지만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은 이와는 다소 다르다. 일부 관행은 법규나 기관의 정책에 명백히 정의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야 하지만 어떤 관행들은 명문화되어 있지도 않고 다소 명확하지 않은 형태도 남아 있다. 이런 것은 멘토링(mentoring)이라는 과정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과정이 통일되지 않아 일부는 서로 상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법규와 운전 기술에 대한 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하지만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이 무엇인지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거나 자격증을 받지 않다.
운전을 하는 경우 자신은 명백히 감시를 당하고 있으며 만일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명백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한다. 하지만 연구자들에 대한 감시 활동은 일관성이 없으며 동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관행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처벌의 강도는 매우 다르다.”
라. 책임 있는 연구 실천의 내용
하지만 책임 있는 연구 활동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원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책임성 있는 연구 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소스에서 추출 가능하다. 그 네 가지는 1) 전문가 집단의 강령(professional codes), 2) 정부 규정(government
regulation), 3) 연구 기관의 정책(institutional policies), 4) 개인의 신념(personal convictions)이다1).
1) 전문가 집단의 강령(professional codes)
2차 세계 대전 전까지는 연구 활동에 대한 공공지원이 매우 적어서 연구자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도 크지 않았으며 연구자들은 연구를 시행하는데 별다른 규제나 자기 통제 원칙이 없었다. 오직 비판적 탐구나 과학적 실험을 통해 진리를 밝히고 이에 대한 실증과 정상적인 검토과정을 통해 정직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믿었다. 대부분의 학문 분야에서는 해당 분야의 책임 있는 연구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일부 분야에서 윤리적인 강령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수는 이상적인 것에 대한 추상적인 기술에 불과하고 복잡한 연구 환경에서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몇몇 영역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강령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의 예에는 국립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 미국과학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미국의과대학협의회(, the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4월 연구윤리 확립 추진 위원회에서 발표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권고문”이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권고문
- 학문
연구는 진리
탐구를 통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지식의
지평을 확장하여
인류 사회에
기여한다. 학문의 진보는
연구의 자유와
연구자의 창의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의 도덕성과
자기 규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 연구
윤리가 제대로
확립되었을 때
비로소 연구의
진실성이 확보된다. 진실성이 결여된
연구를 통해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도 없다. 진리를 추구하는
연구자들은 누구보다도
스스로 연구윤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 최근
일부 연구자들이
연구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밝혀지면서 연구
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 윤리를
훼손하는 행위는
학문 공동체의
성장 동력을
파괴할 뿐
아니라 국가의
위신과 장래까지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불행한 사건을
냉정히 성찰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연구
윤리 교육을
체계화하고 연구
윤리 지침을
마련하여 국제적
수준의 학문에
도달하기 위한
발판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이에『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는
연구의 엄정한
기본 원칙을
세우기 위하여
학계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학문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연구자는
학문적 성실성을
핵심 가치로
받아들이고, 사사로운 이익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며, 아울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는
기풍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2. 대학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구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연구
윤리
교육
프로그램
포함
사항]
▸ 연구
윤리의
배경
▸ 연구의
계획, 수행, 결과
발표의
윤리
원칙
▸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유형, 제보
및
처리
절차
▸ 실험실
윤리, 공동
연구
윤리
▸ 데이터의
정리·보관, 인용
방법
▸ 인간
대상
및
동물
대상
연구
윤리
▸ 연구
결과의
심사
윤리
및
출판
윤리
▸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그
관리
▸ 지적
재산권의
보호
|
3. 대학, 연구소, 그 밖의 학술단체는 연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 윤리 지침을 마련한다. 다만, 기관별·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윤리기준에 차별을 둘 수 있다.
|
[연구
윤리
지침
포함
사항]
▸ 연구
환경
개선과
연구
윤리
교육
활성화
▸ 인간
대상
및
동물
대상
연구
윤리
▸ 연구
결과의
심사
윤리
및
출판
윤리
▸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그
관리
▸ 연구
부정행위
처리
절차
-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조사
및
판정의
절차, 조직
및
담당자
-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부정행위자의
제재
- 조치
결과의
기록과
보고
|
4. 정부는 대학이나 학술단체가 자체적으로 연구 윤리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학문 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제반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 윤리 관련 활동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게는 적절한 장려책을 실시하여 연구 윤리 확립을 유도한다.
2007.
4. 26.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
2) 정부 규정
미국의 경우 학계가 우려 사항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내 놓지 못하자 정부가 규정을 제시하기 시작하였고 규정은 의회에서 시작하였으며 의회는 세 가지 법률을 제정하였다.
1966년 동물복지법(the Animal
Welfare Act),
1974년 국가연구법(the National
Research Act),
1985년 국가연구부속법(the Health Research Extension Act ).
이러한 법률에 따라서 연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연구비를 받는 연구들에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며 자세한 규정은 연방정부의 몫이고 실행하는 권한도 가지게 되었다.
1989년 미국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에 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 (OSI)와 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
Review(OSIR)가 Health Research Extension Act에 기초하여 생기게 되었다. 1992년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가 설립되어 연구 부정에 대한 관리와 함께 연구 진실성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또 다른 소스는 규정(regulations)이다. 이는 연방기구가 의회의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특정 상황에 대해서 규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 하는데 이 때 대중의 의견을 듣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또 다른 것으로 기관 정책과 지침(Agency
policies and guidelines)이 있다. 행정기관들은 정책의 일환으로 정책을 공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들 들어 NIH는 “연구 지원금을 받기 위한 훈련 요구사항 Training
Grant Requirement”(1989),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Required
Education in the Protection of Human Research Participants” 같은 것들이다.
또한 지침이 있다. ORI “Model
Policy and Procedures for Responding to Allegations of Scientific Misconduct (http://ori.hhs.gov/html/policies/model.asp)”은 일종의 지침으로 볼 수 있으며 강제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연구 프로젝트의 경우 하나 이상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들 들어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그렇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몇몇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04. 01. 29 제정)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621호 신규제정 2004. 12. 30.), <생명 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05호 신규제정 2004. 12.
31)이 있다.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 2006년
12월 12일 과학기술부)
황우석 사건 (05, 12)이 계기가 되어 국정현안조정회의 (06. 1. 11)에서 제도적 기반마련 논의되고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제정하여 연구관련 기관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였다. 연구자 개인에 대한 규범은 과학기술계의 자율적인 지침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3) 연구 기관의 정책(institutional policies)
연구기관(
universities, hospitals, private research companies) 등은 연방정부로부터 연구 기금을 받은 경우 연구의 다양한 측면을 규정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다. 기관은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연구 부정에 대한 조사와 보고, 이해 갈등에 대한 조사와 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부서와 담당자, 기관연구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기관의 정책은 연방정부나 주 정부 보다 훨씬 포괄적인데 기관의 정책은 모든 유형의 기관 책임을 망라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관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아래 내용은 한림대학교 생명윤리 심의 위원회 규정이다.
|
한림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2005. 2. 4.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7150호) 및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05호)에 의거하여
한림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외부기관 종사자 1명과 법률자문을
위한 법학과
전임교원 1명을 포함한
관련 학문분야
전임교원으로 하되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생명과학기술(인간의 배아·세포·유전자
등을 대상으로
생명현상을 규명·활용하는 과학과
기술)연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배아
등의 생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유전자
검사·치료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유전정보(유전자은행) 등의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
제 4 조 (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 (보고 및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련(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연구과장이
된다.
제 7 조 (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개인의 의식
책임 있는 연구에 대한 정부, 기관, 전문가 단체의 강령이 중요하기는 해도 이것만을 참조하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한계가 있다.
첫째, 규칙은 대부분 최소 행동 기준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 보다 훨씬 더 높은 행동 규범을 따라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예들 들어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시속 60km를 달려야 하지만 일부 도로는 50km 이하를 달려야 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는 것이다.
둘째, 규칙만으로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갈등과 윤리적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 논문에는 자격이 없는 저자, 이해상충이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과 같은 문제에 대한 모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연구자 개인은 올바른 판단력과 확고한 윤리의식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책임 있는 연구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이에 대해 ORI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만일 특정 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하려고 하는 행위가 다음날 지역 신문에 게재되는 것을 상상해 보면 된다. 만일 동료나 친구, 가족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면 하면 그는 책임 있는 행위를 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연구자로서 책임을 안다고 하는 전제는 필요하다”
마. 이해를 위한 문제 풀이
객관식 문제
1. 책임 있는 연구 활동의 원칙과 이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정직성: 정직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공약을 존중하는 것
(2) 정확성: 사실만을 기술하며 부적절한 비뚤림(bias)을 피한다.
(3) 효율성: 연구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낭비를 막는 것. 연구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4) 객관성: 연구결과를 정밀하게 보고하고 오류를 피하도록 주의하는 것
가. 1, 2, 3
나. 1, 3
다. 2, 4
라. 4
마. 1, 2, 3, 4
2. 다음 설명은 연구 윤리의 범위 중 어디에 가장 가까운가?
|
과학연구의 전
과정에서 속임수, 부주의, 자기기만 등으로
인해 정확성과
객관성에 결함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연구 환경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론, 데이터 혹은
결과물 등에
대한 위조, 변조, 표절(Fabrication,
Falsification and Plagiarism)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
가. 과학 연구에서의 진실성
나. 공로배분의 공정성
다. 연구실 문화의 민주성
라. 특정 연구 대상이나 연구 방법에서의 윤리성
마.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성
3. 다음 내용은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의 내용의 원천 중 어디에 가까운가?
|
규칙은 대부분
최소 행동
기준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 보다
훨씬 더
높은 행동
규범을 따라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예들 들어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시속 60km를 달려야
하지만 일부
도로는 50km 이하를 달려야
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는
것이다.
|
가. 전문가 강령
나. 개인의 의식
다. 정부 법령
라. 기과의 정책
마. 규정
토론 문제
1.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연구 윤리, 책임 있는 연구 수행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배우게 되는가? 그런 관행은 적절한가?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2. 연구 윤리 범위 중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는가?
참고문헌
연구 부정행위
Research
Misconduct
☞ 학습목표
연구 부정행위의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연구 부정행위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숙지한다.
☞ 구체적 학습목표
1. 연구 부정의 개념을 이해한다.
2. 연구 부정행위의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한다.
3.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한다.
4. 연구 부정행위의 사전 예방과 사후 검증 체계 구축에 대해 이해한다.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숙지한다.
6.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과 검증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7. 검증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이해한다.
가. 용어
연구 윤리는 과학 연구에서의 진실성 추구(연구내용결과에 의도적인 속임수나 부주의 없이 정확성과 객관성 확보), 공로 배분의 공정성(연구참여자 간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공로를 합당하게 배분), 연구실 문화의 민주성(구성원 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 자원의 공평한 배분), 특정 연구 대상이나 연구 분야에서의 윤리(생명의학 윤리, 정보통신 윤리, 나노윤리),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성(적절한 연구비의 사용, 전문가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연구비의 적합한 사용, 전문가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연구 윤리의 수행 정도를 긴 스펙트럼으로 나열했을 때 한쪽 끝에는 바람직한 연구 행위가 있다. 바람직한 연구 행위를 일컫는 말은 미국에서는 책임 있는 연구 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이라 하고 유럽에서는 건전한 연구 활동(Good Scientific Practice)라 한다.
건전한 연구 활동 혹은 책임 있는 연구의 수행에서 벗어나면 연구 윤리(research
ethics) 혹은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영역을 의심스러운 연구 행위 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 QRP)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에는 편견에 사로잡힌 연구, 통계실험장비의 오작동, 빈약한 연구 설계, 데이터 관리의 소홀 및 부주의, 학생 지도에 대한 무관심 등이 있다. 이런 영역은 강도 면에서 약하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유혹을 느꼈을 정도로 사소한 문제일 수 있다.
반면 벗어난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의도적일 때를 연구 부정이라고 한다. 연구 부정의 범위는 단체에 따라서 협의 혹은 광의로 구분한다. 연구 부정행위를 날조(fabrication),
변조(falcification), 표절만으로 국한하는 협의의 정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단체는 미국 과학 학회(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의학 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등이다. 미국 연방 정부도 이러한 협의의 정의를 선호한다. 반면에 연구 부정에 이들 세 가지 이외에 “다른 심각한 위반(other
serious deviation)”을 포함하는 광의의 정의를 가진 단체는 국립 과학 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Public Health Service 등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연구 부정과 연구 부정직(research dishonest)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연구진실성 저해(소위 FFP), 이중 출판 같은 출판 부정행위, 데이터의 부적절한와 처리보관, 연구주제 상 부정행위, 연구관리 부정행위, 개인적 부정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나. 국내외 현황
1) 우리나라의 현황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사건 당시 국내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진실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미비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문제가 언론을 통해 먼저 제기되고, 연구진실성 검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회적 갈등 및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성 및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대내외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연구 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06.1.11, 국정현안조정회의), 과학기술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16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06.6.22)에서 확정하고, 동 지침의 근거법령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한 후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공포하였다.( ’07. 2월)
2) 외국의 현황
선진국들의 경우도 대부분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연구 기관들의 자율검증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1974년 색칠한 쥐 사건을 계기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1980년대부터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하였다. 보건복지성(DHHS) 산하 공중위생청(PHS)에서는 1985년「보건연구부속법(Health
Research Extens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1992년에는 생명의료 및 행태과학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등을 검증하기위해 국립보건원의 OSI(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와 보건차관보실의 OSIR(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 Review)를 통합한 ORI(Office of Research Integrity)를 설치하였다.
’00.12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에서는「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방정책(Federal
Policy on Research Misconduct)」을 마련하였는바, 연구의 계획, 실행, 해석 또는 결과보고 등에서의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을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연구에만 적용된다. 현재 9개 정부 기관에서 연방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침 또는 검증기구를 마련. 운영 중에 있다.
독일
미국과 같은 연방정부 차원의 별도 기구는 없으나, 헤르만·브라흐 사건을 계기로 1997년 독일연구재단(DFG)이 중심이 되어「훌륭한 학문연구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 대학과 연구기관에 통보하였다. 동 권고안은 회원들의 충실한 연구를 위한 지원 및 관리의 차원에서 과학윤리 및 부정행위 신고 방법에 관한 16개 항목을 제안하고 있으며, 각 대학과 연구 기관은 이에 기초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연구 부정행위 방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영국
말콤피어스 사건을 계기로 1998.12월 과학기술청(OST)과 8개 연구회(Research
Council)가 공동으로「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한 보호조항(Safeguarding
good scientific practice)」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훌륭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원칙이 담겨 있는 바, 과학기술청과 8개 연구회로부터 연구지원금을 받고 있는 연구기관들은 이 원칙에 따라 데이터 관리·윤리 교육·조사기구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연구회는 각 연구기관의 연구진실성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일본은 동경대 등 학계에서 논문조작 사건이 잇따르자, 산업기술총합 연구소, 이화학연구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일본학술회의는 ’06.4월「과학자의 행동규범」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학술회의의「과학자의 행동규범」은 국내외 모든 분야의 과학자 커뮤니티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연구 자세에 관하여 총 11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연구기관은 동 행동규범을 토대로 기관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과학자의 성실하고 자율적인 연구윤리를 촉진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윤리프로 그램을 자주적이면서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문부과학성이 연구부정 및 연구비 부정사용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였다.
OECD
’06.2.6~7일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14차 범지구과학포럼(GSF,Global Science Forum) 회의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논문조작 등 각종 과학 부정행위(Scientific Misconduct) 방지를 위한 논의를 OECD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덴마크, 캐나다, 핀란드, 미국 등 대다수의 회원국들도 동 작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과학 부정행위 작업반은 과학부정행위의 유형 정립, 요인 분석 및 대책마련을 주 논의 사항으로 하고, 각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실천방안(good
practice list) 등을 OECD 가이드라인 혹은 권고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부정행위의 유형, 과학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과학부정행위의 원인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 중에 있다. 분석결과는2007. 2. 22 ~ 23일 양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OECD「과학 부정행위 방지」워크숍에서 발표되며, 3.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GSF 총회에 제출된다.
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을 하나의 지침으로 발표하였는데 그것이 2006. 2월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다.3) 과학기술부에서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해설>을 2006년 8월 11일에 배포하였는데 이 문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한 해설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의 내용은 이 문건에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지침의 성격 및 적용대상
가) 지침의 성격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과학기술부 훈령이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지침의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본 지침은 연구자 개인보다는 연구와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당사자인 연구수행기관(대학, 연구소 등)과 연구지원기관(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에게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연구자 개인에 대한 윤리규범은 과학기술계 또는 해당 연구기관에서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 본 지침에 포함하지 않았다.
나) 적용 대상
이 지침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수행기관(이하“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중앙행정 기관 및 전문기관(이하“연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다)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바람직한 규범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진실성 유지 및 생명윤리 등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규범 준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나 그 외에도 연구비의 적정 사용,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실 문화 조성,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 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연구윤리 분야 중, 본 지침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정확성과 객관성의 유지 등 연구진실성 확보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생명윤리, 연구비의 적정 사용, 연구실 안전 등 다른 연구윤리 분야는 아래의 표와 같이 해당 관련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연구윤리 범위 관련 주요 규정 주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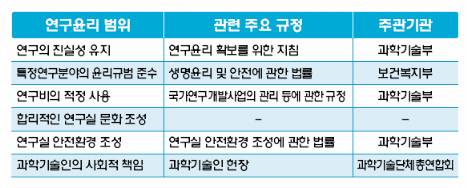
2) 연구윤리의 개념 및 연구부정행위의 범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3) 연구 부정행위 사전예방 및 사후검증 체계 구축
가) 연구 환경 개선
연구 부정행위 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은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도·환경적 요인이 연구부정행위의 토양을 형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한 연구과제 기획·선정 시스템이 있을 수 있으며, 환경적 요인은 연구비 수주 경쟁의 심화, 단편적 성과주의의 지나친 강조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연구시스템의 거대화와 복잡화로 인해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이 집단의 분위기에 동화·희석되면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무감각해지거나 자기합리화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연구자들이 연구제도 및 환경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의 확보는 연구자 개인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도 이에 필요한 제도 및 환경 조성의 책임이 있음을 본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나) 연구 윤리 교육
연구부정행위를 사후에 적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 교육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연구의 수행, 연구내용의 기록 및 보존, 연구결과물의 작성 및 제출등에 관하여 연구기관, 연구실 마다 제각각 상이한 관행이나 기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관행이나 기준 대부분은 책임 있고 효율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것들이지만, 일부는 국제 표준이나 과학기술계의 보편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 연구원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 연구기관들은 고유의 연구 분야 및 기관임무의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기준 및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키고 단지 연구부정행위의 금지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자로서의 이상적인 자세 및 가치판단 등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의 연구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윤리 교육이 요청된다.
-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준수 사항
- 연구자로서 지양해야할 부정행위 또는 기관 차원에서 규제하는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발생 또는 인지할 때 신고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기관의 각종 정책 및 진실성 검증 관련 절차 등
다) 연구진실성 검증체계 구축
본 지침은 연구 부정행위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진실성 검증의 일차적인 책임이 연구기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연구기관들이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구기관마다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학문과 연구의 중심지인 대학 및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정직한 연구자를 보호하고 소속 연구자가 행한 부정행위를 책임 있게 규명하기 위한 조사 절차 및 관련 규정 등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부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연구자를 고용한 해당 연구기관이 다른 기관에 비해 관련자 조사 및 증거자료 확보 등 연구진실성 검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진실성 검증을 정부나 제3자가 대신할 경우, 자칫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연구 분위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 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임 있는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연구기관이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은,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 등을 명시한 자체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체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본 조사 수행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등이다.
각 부처와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연구지원기관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연구기관이 실시한 자체검증결과의 타당성과 합리성 검토
② 자체검증결과를 토대로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후속조치 실시
③ 자체검증결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재조사 등 실시
④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인센티브 마련 등 각종 시책 마련과 시행
⑤ 상기 역할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연구 부정행위 발생할 때 해당 연구기관의 자체검증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다음 4가지의 경우에는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검증을 할 수 있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연구기관의 예비조사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연구기관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 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연구 기관이 자체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연구지원기관에 직접 조사 수행을 요청한 경우
연구 지원 기관은 연구기관의 자체검증 및 연구지원기관의 검토과정을 거쳐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협약의 해약 및 연구비 회수, 연구비의 집행 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연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 3년 이내 범위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정행위 발생 자체로 인해 연구기관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불이익 처분은 없다. 다만, 연구지원기관은 연구기관이 자체검증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부정행위 제보를 묵살, 은폐하거나, 진실성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내부제보자 보호에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가) 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보자는 인지한 부정행위 내용이나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보자는 반드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다른 당사자나 목격자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듣거나 관련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대신 제보를 할 수 있다. (자기관련성 또는 직접성의 불요) 그러나 제보자가 된 이상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원활한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로부터 진술을 위한 출석이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연구 활동이 고도로 전문화 분업화됨에 따라 외부에서 해당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연구부정행위의 대다수가 주로 내부제보에 의해 외부로 알려지게 된다. 따라서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립 및 자율검증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 정착은 내부제보자 보호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제보자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절대 제보를 하지 않을 것이며, 제보가 없으면 진실성 검증 체계 역시 작동하기 어렵고 연구부정행위는 음성적으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보자의 보호 수단은 1) 익명제보의 허용, 제보자 신원정보 공개의 절대 금지,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절대 금지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익명 제보를 허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조사자가 제보자와 접촉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한편으로 무분별한 음해성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익명 제보할 때는 제보의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전자 우편으로만 제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제보내용에는 연구과제명 또는 문제가 되는 논문명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그리고 곧바로 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를 담도록 하였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익명제보는 예비조사단계에서 기각된다.
제보자의 신원 공개를 절대 금지된다. 만약 제보자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비록 그것이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 하더라도 제보의 접수 및 조사에 관계된 모든 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본 지침은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지원기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 할 때도 제보자의 성명은 익명처리 하는 등 제보자 신원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절대 금지된다. 제보자가 연구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원하지 않는 전보나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왕따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물리적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은 최대한 보호해야 하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부정행위 조사의 대상이 된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것으로 추정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자, 해당 과제의 참여자 또는 논문저자로 등록된 자,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한 자 등은 피조사자에 포함된다. 반면, 같은 연구실에 있어도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자는 일단 참고인 신분이 된다.
피조사자 신분이 되면 진술을 위한 출석 및 실험실 출입 제한 등 각종 행동에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에 피조사자 지목은 상기 요건에 따라 신중 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피조사자로 지목되어 조사가 진행되어도 연구 부정행위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사내용 및 관련자들의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나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기관 내부, 연구지원기관 또는 상급기관, 언론 등에 공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검증 주체
연구 부정행위 발생할 때 연구기관 자체검증 원칙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관리 감독하는 연구기관에 일차적인 검증책임이 있다. 만약 연구 부정행위 검증을 연구지원기관 등 외부기관이 대신할 경우연구기관이 연구 부정행위 예방 및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자체역량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연구의 자율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계의 자정기능은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연구부정행위에 책임 있게 대응할 때 실현된다.
둘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의 경우 관련 기관이 상호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검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양 기관이 동일하게 부담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등으로 연구수행 비중이 기관 마다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검증책임의 부담은 연구수행 비중에 따라 관련 기관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래의 경우 연구지원기관에 진실성 검증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더라도 연구기관도 검증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의하도록 한다.
①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관련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조사 등 진실성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②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
국과위 전문위원회는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된 대형 연구 부정행위, 또는 다수 연구지원기관이 참여한 사업에서의 연구부정행위나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연루된 연구 부정행위 등 개별 연구기관이나 연구지원기관 차원에서 조사하기 어려운 사안을 맡게 되며 사안별로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된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불어온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사건의 경우에도 서울대가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전례가 있으므로, 국과위 전문위원회는 주로 연구기관 자체검증결과의 최종 점검 책임을 맡고 있는 각 부처 및 연구지원기관선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안을 맡게 될 것이다.
검증 시효
모든 연구부정행위는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사건 당사자들의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연구자들의 이직이 빈번히 이루어져 조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진실성 검증 시효는 5년이며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과학 연구의 특성상 부정행위가 언제 저질러졌는지에 대해서는 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외부인은 정확한 시일을 알 수 없고, 주로 월 단위의 개략적인 시간 밖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기를 시효의 기산일로 삼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구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한 날, 또는 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따라서 해당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구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한 날, 또는 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만일 해당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구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논문 발표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의 발표일이 시효 기산일이 된다. 예들 들어 2001.4.15일에 이루어진 부정행위를 이용한 연구의 발표가 2001.9.20일에 이루어지고, 이를 다시 인용한 연구결과를 2002.5.15일에 발표한 경우 최종 시효기산일은 후자인 2002.5.15일이 된다.
만일 연구의 내용이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 등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효와 무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검증 원칙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연구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 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증거 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의 원칙”이란 양자의 증거를 비교하여 더욱 신빙성을 가지는 증거가 검증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원칙으로, 조사기관의 의혹 제기에 대해 연구자가 제대로 반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연구자가 주장하는 연구 진실성에 대한 확신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기관의 의혹 제기가 한층 신뢰성을 얻게 되고 피조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영미법상 입증기준은 ①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음(beyond a reasonable doubt), ②명백하고 확신할 만한 증거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③증거의 우위 (preponderance of evidence)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가장 엄격한 입증기준은 ①로서 주로 형사재판에 주로 적용된다. 증거에 대한 고도의 확신(80~90% 이상)을 필요로 한다. 반면 ③은 가장 약한 기준으로서 양자의 증거를 비교하여 1%라도 더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우위를 갖게 되며, 형사소송에 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가 덜한 민사소송 또는 정부 및 유사기관 위원회
등에서 주로 활용되는 입증기준이다. 따라서 ‘증거우위 원칙’은 증거에 대한 고도의 확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조사기관의 입증책임이 가장 완화된 형태이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피조사자에게 불리한 입증기준이다. 만약 연구자가 조사기관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제대로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불리하게 되며, 증거를 훼손할 경우에는 오히려 모든 입증책임이 연구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본 지침 역시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조사 기관에 있다고 하여 연구자가 부정행위 무혐의에 대한 입증을 태만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입증책임 소재와는 별도로 증거 우위의 원칙이라는 입증기준을 채택하는 한, 연구자 역시 1%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차별해선 아니 된다. 여기서의 ‘동등하게 보장한다’ 함은 산술적으로 동일한 횟수와 시간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조사할 때 서로 상충되는 진술이 제시되었을 경우 어느 한쪽의 말만 참고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쪽에게도 이 내용을 알리고 충분한 대응진술과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이에 대한 사전 고지가 필요한데 사전고지를 하여야 하는 이유는 당사자들이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에 있어 충분히 대비를 하게 하여 보다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다. 사전고지일자에 관해선 통상 3일에서 7일 사이가 적당하나, 아무리 늦어도 24시간 전에는 통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기관의 연구윤리와 연구진실성 자율검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나 특히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조사방향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기존의 조사방향을 크게 전환하거나 조사내용 및 결과 자체를 변경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리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할 것이다.
검증기간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예비조사로부터 판정까지는 6개월 이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증기간은 신고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이며 이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은 자율적으로 조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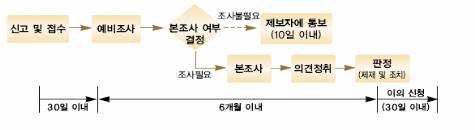
검증기구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 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조사 위원회의 전문서 확보는 중요한데 그 이유는 본 조사 수행할 때 외부의 문가들을 참고인 및 자문인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조사위원회의 주체적인 판단을 위하여 전문가를 일정부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조사위원회 구성할 때 관련 전문가를 최소 절반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본조사의 공정성과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기관 소속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20%이다. 외부인의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조사위원회는 상설, 비상설 모두 가능하며 상설 연구 진실성 위원회에서 조사 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전담부서에서 조사 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제보내용의 본 조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본조사가 가급적 조속한 시간 내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소요건(조사대상의 적합성, 시효의 적절성, 제보의 구체성과 명확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이를 결여한 모든 사안들이 바로 본 조사 단계로 직행하면서 발생하는 과부하를 사전에 차단하여 조사제도의 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예비조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한다.
① 제보내용이 자체규정의 연구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검증시효의 충족 여부(5년)
③ 제보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가령, “홍길동 교수가 남의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있다”라는 제보는 누구의 논문을 표절하였는지 그 대상이 명확치 않으며 홍교수를 소환하여 누구의 논문을 표절했는지에 대해 직접 심문한다하여도 순순히 자백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조사실익이 없고, 또한 구체적인 물증 없이 조사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조사기관이 직접 표절 대상 논문들을 일일이 검색하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 조사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따라서 예비조사 단계에서 기각될 수 있다. 반면 제보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예비조사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제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증거자료도 미리 제출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 연구 부정행위 주체 및 관련자의 소속과 실명, ②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등 결과물, ③ 부정행위의 내용 및 일시(또는 시효기산일) 등이 있으면 구체성과 명확성의 최소요건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익명제보일 경우 제보내용은 바로 본 조사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구체성과 명확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예비조사의 경우 조사기구의 구성이나 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예비조사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임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연구진실성 관련 부서 또는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등 기관 실정에 따라 자유로운 형태로 운영하면 된다. 예비조사의 기간은 연구기관은 제보의 접수일 또는 연구지원기관으로부터의 이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착수로부터 판정까지를 6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사 기간을 여유 있게 확보하기 위해선 예비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예비조사 결과 본 조사 실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해당 내용을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예비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사
본 조사는 제보된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로서, 이 과정에서 해당 연구실 통제, 피조사자 소환 등 권리 침해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수행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조사의 과정은 아래와 같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과의 면담 및 자료검토 등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조사단계 조사내용 및 중간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변론단계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검토하여 판정을 위한 최종 조사결과를 도출하는 단계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이나 본 조사 수행의 방법은 검증 원칙과 검증 기간에 준한다.
판정 이전에 반드시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최종 이의제기 및 변론은, 조사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져 그대로 판정단계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본조사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 실시하도록 한다. 연구지원기관에 최종조사결과를 보고할 때,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과 이의 반영 여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판정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기관은 연구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지원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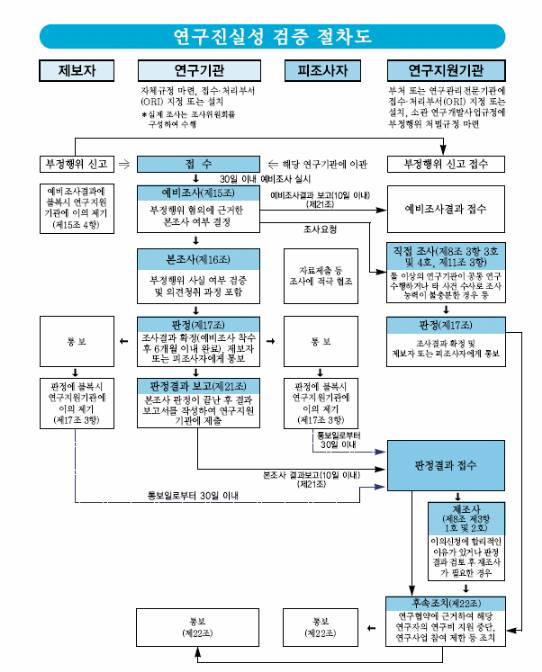
검증에 따른 조치
조사 기록과 공개
조사 담당 기관은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지원기관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기록이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에서의 각종 회의 내용,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 증인과의 면담 내용, 제보자.피조사자.참고인.증인 등이 제출한 자료 및 증거물, 전화.이메일을 통한 인터뷰 내용, 제보자, 피조사자의 변론 및 이의신청 내용, 6) 전문가 검토, 자문의견, 7) 예비조사,본조사 결과보고서 모두를 말한다. 기록을 보존하는 이유는 조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이의 신청할 때 활용하는 등의 용도가 있다.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지만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제보자의 신원 정보는 반드시 비공개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피조사자의 경우도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지만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나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그리고 그밖에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기관 내부, 연구지원기관 또는 상급기관, 관련기관 및 언론 등에 공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 결과의 보고
연구지원기관은 연구기관에 수행을 위탁한 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정직하게 수행되도록 하는데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므로, 연구지원기관은 연구기관 자체검증결과의 보고를 통해 소관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의 부정행위 전말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 조사)
4)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
5) 관련 증거 및 증인(본 조사)
6)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 조사)
7)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 조사)
연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발생하였거나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우려가 명백한 경우는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연구지원기관은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연구기관 자체검증 이후 연구지원기관은 연구기관 자체조사 내용,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 검토하며 만일 결과 문제가 있으면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하도록 하거나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재조사 실시할 수 있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적절한 제재 조치를 실시하면 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후속조치 종류에는 협약의 해약 및 연구비 회수, 연구비의 집행 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연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 3년 이내 범위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이 있다. 만일 연구기관이 연구부정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및 자체성과평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 배분 및 조정, 간접경비 계상 기준 결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해를 위한 문제
객관식문제
1. K 박사는 5년 동안 독자적으로 연구해왔으며 연구는 잘 진행되었다. 하지만 같은 과 선임자의 논문을 보니 자신이 연구한 발표하지 않은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선임자가 저지른 행위는 어디에 가까운가?
가. 표절 나. 위조
다. 변조 라. 부정한 논문 저자
마.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2. 선임 연구자는 K박사의 승진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위의 경우 K 박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 선임 연구자에게 해명을 요구한다. 나. 이 문제를 학과장에게 알린다.
다. 익명으로 이 문제를 연구 지원 부서에 알린다.
라. 승진평가가 끝나기 전에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마. 같은 연구 팀에게 이 문제를 보고하도록 권유한다.
3. 다음 중 부정한 논문 저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
가. 아무개는 기여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논문저자에 포함됨
나. 본인 또는 아무개는 기여가 있다고 보는데 논문저자에서 제외됨
다. 아무개는 기여도가 많아야 20% 정도인데 연구책임자가 40%로 인정함
라. 본인 또는 아무개는 기여도가 최소 40% 이상인데 연구책임자가 20%정도만 인정함
|
1. 가, 다 2. 나, 라 3. 라 4. 가, 나, 다
5. 가, 나, 다, 라
4. 2001.4.15일에 이루어진 부정행위를 이용한 연구의 발표가 2001.9.20일에 이루어지고, 이를 다시 인용한 연구결과를 2002.5.15일에 발표한 경우 최종 시효기산일은 언제인가?
가. 2001.4.15 나. 2001.9.20
다. 2002.5.15 라. 2006. 8. 20
주관식 문제
1. 우리나라에서 정한 연구 부정행위 문제의 범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2. 현재 연구 부정행위는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참고문헌
임상연구에서의
의료윤리적 고려사항과 임상연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 Ethics
Committee
☞ 학습목표: 임상연구를 수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의료윤리 기준들을 이해한다.
☞ 구체적 학습목표:
1. 의료윤리의 기본개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뉘른베르크 강령, 헬싱키 선언, 벨몬트
리포트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역할, 구성, 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피험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 기본조건인 동의서(informed consent)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불과 수년 전에 한국 사회를 휩쓸고 지나간 ‘황우석 사건’을 통해 연구윤리
부재의 심각성에 대하여 큰 교훈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연구 부정’이라는 결론으로 정리되면서 사회적 관심은 ‘연구 성과의 진위’에만 머물게 되었고, 사실 그 과정에서 매우 면밀하게 검토되고 재평가되어야 했던 ‘난자 공여자 보호’와 관련된
연구윤리 문제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갔다.
임상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문제로서 ‘피험자
피해’는 사실 서구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매우 중요한 주제로 논의가 되어왔다. 특히,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독일의 나치에 의하여 자행된
인체를 대상으로 한 각종 실험과, 일본의 생화학 부대에서 자행된 생체실험은 이미 인류역사에 커다란 충격과 오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의료윤리 논의의
시작을 히포크라테스 시대로부터 찾아 볼 수도 있겠으나, 지금과 같은 현대적 논의는 대략 60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 의료윤리 문제제기의 역사적 흐름
의료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나치의 의사들에 의하여 자행된 인체대상 실험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전범재판소에 의해 뉘른베르크 강령(The Nuremberg Code, 1947년)이 발표되면서 임상실험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기준’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사건(1962년)이
발생하고, 이후 세계의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현재까지도 그 윤리적 기준의 핵심을 제공하고 있는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 1964년에 채택되어, 2004년까지 7차례 개정이 이루어짐)이 채택되면서 의료윤리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후 터스키기 매독 연구(Tuskegee Syphilis Study)를
계기로 하여 작성된 벨몬트 보고서(The Belmont Report, 1979년)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의 윤리적 원칙’을 천명하였고, CIOM(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edical
Sciences, 1993년)이라는 WHO 산하기구는 피험자 관련 ‘생명의학연구에 관한 국제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을 공포하였으며, 미국,
EU, 일본 정부 및 기업에 의하여 결성된 ICH(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는 1996년에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을 통하여 임상시험 관리를 위한 ‘표준가이드라인(GCP, Good Clinical Practice)’을 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현재 각 국가별로 사용되고 있는 임상시험의 각종 표준기준들을 제시하게 되었다.
2. 의료윤리의 기본개념
모든 의사들에게 있어서 ‘환자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언제나 직업윤리의 기준으로 언급되고 있다. 의사들 또한 스스로 ‘나의 이익보다 환자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말하곤 한다. 물론 어떤
의사들은 오직 돈이나 사회적인 명성을 위해 의사로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직업적 이타성으로
인하여 의업은 다른 직업과 확연히 구분되며 때로는 숭고하다고까지 얘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업의 태생적 이타성이 진정한 선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여러 제약들’이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얘기되고 있다.
“첫째, 자기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 특히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즉, 선행의 의무는 자율성 존중의 의무에
의해 조절되어야 한다). 환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환자가 원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둘째, 자기가 주는 도움이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야 한다(선행의 의무는 악행금지의 의무에 의해 조절되어야 한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소망, 필요와 권리들을 고려한다(선행의
의무는 정의의 의무에 의해 조절되어야 한다). 의료자원이 희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의료자원이 정의롭게 배분되어야 한다. 정의의 의무는 의료자원의
공정한 배분과 더불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런 효율성과 관련해서 의학계는 의료윤리의 중요한 국면으로서 비용-이익분석을
수용해야 한다.”
사실 의사의 모든 의료적 행위가 ‘선의’로만 이해될
수 없다. 의사들이 ‘나는 나의 환자를 위해서 그러하였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선의’를 문제의
합리화에 가장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현실적인 여러 제약들을 고려한다면 ‘선의’가 반드시 올바른 ‘윤리적 실천’이라고만
볼 수 없다.
3. 임상연구와 관련된 규약들
3.1. 뉘른베르크 강령(the Nuremberg Code, 1947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는, 전쟁 중에 23명의 독일군 장교, 의사 및 보건행정 공무원들이 자행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비윤리적인 실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전범 재판소는 유죄판결에 앞서서 10개항으로 이루어진 ‘피험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기초적 요건’이 명확하게 표현된 강령을 제시했는데, 이는 최초의 국제 연구윤리지침으로서 허용가능한 의학연구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주 내용으로서 피험자(연구대상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수적임을 선언하면서,
사회의 이익이 개인의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① 인체실험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이것은 실험대상자가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어떠한 폭력, 사기, 속임, 협박, 술책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고, 배후의 압박이나 강제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상태여야 한다. 또한, 이해를 통하여 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주관적 문제의 요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고 피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험 대상자가 내린 긍정적인 결정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에게 실험의 성격,
기간, 목적, 실험방법 및 수단, 예상되는 불편함 및 위험,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올 수 있는 건강 혹은 개인에의 영향에 대해 알려야 한다. 동의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은 실험을 시작하고 지시하며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달려 있다. 이것은 타인에게 법적인 책임 없이는 위임할 수 없는
개인적 의무이자 책임이다.
② 연구는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방법이나 수단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가치 있는 결과를 낼만한 것이어야 하며, 무작위로 행해지거나
불필요한 연구여서는 안 된다.
③ 연구는 동물실험
결과 및 연구 중인 질병이나 기타 문제의 자연 경과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계획되어야 하고, 그 예상되는 결과가
실험 수행을 정당화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연구는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해를 피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⑤ 사망이나
불구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 자신이 피험자로 참여하는 연구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연구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⑥ 실험에서
감수해야 할 위험의 정도가 그 실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⑦ 손상, 장애, 혹은 사망 등 미미한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⑧ 실험은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수행하여야 한다. 실험을 수행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은 실험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기술과 주의가 요구된다.
⑨ 실험을 하는
도중에 피험자는 자신이 더 이상 실험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면 실험을 끝낼 자유가 있다.
⑩ 실험과정
중에 연구책임자인 과학자는 자신의 성실성, 우수한 기수 및 주의 깊은 판단에 의해서 실험을 지속하는 것이 피험자에게
손상, 장애, 혹은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실험의 어느 단계든지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3.2. 헬싱키 선언 (World Medical Association Declaration of Helsinki -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세계의학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생체의학 연구에 대한 권고’로서, 1947년의 뉘른베르크 강령을 확립하는 선언을 만들기 위해 1964년도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회의를 열었으며, 그 이후로
2008년까지 총 8회의 크고 작게 개정된 헬싱키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선언의 골자는 뉘른베르크
강령에 덧 붙여서, 피험자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보다도 항상 우선하며, 임상 연구의 모든 피험자는
알려진 최상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10월에 개최된 서울회의에서는 기존의 선언이
보다 현실에 적합하도록 총 35 조항으로 새롭게 개정되었다(참고자료 - 영문 헬싱키 선언문).
3.3. 벨몬트 리포트 (The Belmont Report, 1979년)
미국의 국가연구법(National
Research Act)이 1974년에 미국의회를 통과하면서, ‘생명의학 및 행동연구에서의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이 위원회는 1979년에 벨몬트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위원회에
의해 확립된 기본적인 윤리원칙을 정리한 것으로서, 1932년부터 1972년까지 40년간 미국정부에 의해 자행된 이른바 터스키기 매독연구(Tuskegee Syphilis study)의 폭로로 인하여 논란이 된 여러 윤리적 논의들을
종합한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의 세 가지 윤리적 원칙인 ‘인간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의학연구에서
필수적인 윤리적 원칙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간존중의 원칙(Respect for
Persons)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와 취약한 피험자 보호(protection of vulnerable
subject)를 그 내용으로 한다.
선행의 원칙(Beneficence)은 위험과 이득의
평가(risk / benefit assessment)를 통해 예측 가능한 유해와 이득을 따져보는 것으로서, 피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이익을 최대로 하고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정의의 원칙(Justice)은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들의
공정한 선정을 얘기하는 것으로 피험자의 사회경제적 계층, 성별, 연령, 종교, 학력, 출신지역 등에 따라서 공평하지 않게 대상자를 선정하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특히나 사회경제적 어려움 혹은 질병 때문에 부당하게 이용당하기 쉬운 상태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연구대상자로 유인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3.4. CIOMS 가이드라인(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edical
Sciences, 1993)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의학기구위원회는 생명의학 연구와
관련된 윤리문제에 관한 기준설정 작업을 시작하여 1982년에 ‘인간 대상자를 포함하는 생명의학연구에 대한 국제윤리가이드라인(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을 제안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개발도상국 같은 특수한 상황에 적절한 임상연구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최종적으로 1993년에 공포되었다. 공포 후에도
추가적인 논의가 지속되었고 2002년 1월에는 새롭게 개정된 안이 웹사이트에 게시되기도 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국가의 의무조항도 규정하고 있는데,
“선진국이 본국에서 할 수 있는 연구를 후진국에서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후진국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선진국의 윤리위원회와
연구가 행해지는 후진국의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마친 후에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의학 연구의 윤리적 정당성 및 과학적 유효성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윤리심사위원회, 동의서 취득, 임상시험 참여의 유인, 연구
참여로 인한 이익과 위험의 균형 및 위험의 최소화, 임상시험에서 대조군의 선택, 취약한 대상(어린이,
임산부, 무능력자 등)에 대한 특별조항, 비밀보호, 연구 참여로 인해서 야기된 손상의 치료와 보상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3.5. ICH-GCP(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 Good Clinical
Practice, 1996년)
ICH는 1990년 미국, EU,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이 각 지역의 의약품 관련 법제를 표준화할 목적으로 시작한 회의로서, 1996년에 ‘임상시험관리기준(GCP, Good Clinical
Practice)’을 제정하였다. 임상시험관리기준(GCP)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설계하고, 수행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는데 관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윤리적, 과학적 기준이다. 이는 헬싱키 선언에 근거하여 피험자의 보호와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 / 독립적
윤리위원회 (IRB / IEC, Institutional Review Board / Independent Ethics Committee)의 책임,
구성·기능·운영, 절차, 기록과 임상시험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ICH-GCP의 원칙으로는, 임상시험은 헬싱키 선언
및 GCP에 따라 시행하며, 임상시험의 이익이 위험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고, 피험자의 권리·안전·복리는 과학과 사회의 이익보다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임상시험은 과학적으로 타당해야 하고,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하고,
피험자의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임상시험과 관련된 각종 정보는 기록·처리·보존되어야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3.6.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 (KGCP, Korean Good Clinical Practice)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10월부터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KGCP)'이
시행됨으로써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체계가 법적으로 규정되었고, 이후에 개정이 거듭되면서 2000년 1월 4일에 개정된 KGCP부터는
ICH-GCP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임상시험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가장 최근 안은 2008년 6월 27일에
개정된 것으로서, 이 KGCP는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임상시험의 계약 및 시험기관(제5조~제6조), 제3장 임상시험심사위원회(제7조~제9조),
제4장 시험자(제10조~제22조), 제5장 임상시험의뢰자(제23조~제47조)에 대한 규정을 통해
임상시험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제반 기준들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3.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법률(약칭)은 생명과학의 발달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생명윤리의 부작용을 다루고자 한 법률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최근의 개정안(2008년 6월 5일 개정)이 만들어지기까지도
상당한 논란이 있어 수차례 개정되어 왔다.
동 법률은 법적 관리대상기관을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연구기관, 유전자은행, 유전자치료기관’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자세한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흔히 속하게
되는 ‘유전자연구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사항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
유전자연구기관 기관위원회(IRB)는 유전자연구를 위한 연구계획서의 심의,
동의권자로부터의 동의, 검사대상물의 보관·제공 및 폐기, 개인정보관리 등 관련 업무 행위가 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면밀히 심의한다.
1)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세부적인 연구 목적을 기재한 법정 서식의 동의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심의한다.
① 유전자연구 목적은 포괄적으로 기술하기보다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권장한다.
② 연구방법 설명 시 가능하면 연구 대상 유전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설명하도록 권장한다.
2) 유전자연구 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인체 유래 검사대상물에 대한 유전자연구계획서는 다음을
숙지하여 심의한다.
① 생명윤리법 시행(2005. 1월) 이후에 채취된 검사대상물로 법정 유전자연구 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검사대상물은 유전자연구에
사용할 수 없음
②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채취되어 보관해오던 검사대상물은 검사대상물 제공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화(anonymization)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적인 검사 검사대상물과는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유전자연구에 이용할 수 있음
3) 유전자연구를 위해 검사대상물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
및 제공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검사대상물을 이용하는 경우
ⅰ)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여부
ⅱ) 개인정보를 가지고 연구해야 하는
필요성
②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검사대상물을 이용하는 경우
ⅰ) 검사대상물 획득 방법 및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술 여부
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검사대상물을 익명화하는
경우, 익명화 방법에 대한 정보 보안 대책 수립 및 그 적절성
③ 필요시 익명화 해제 여부에 대한 원칙 수립 여부
ⅰ) 익명화 해제의 조건
ⅱ) 필요시 익명화 해제 후 피험자의 의무기록 열람 여부 및 열람 조건
ⅲ) 익명화 해제 후 개인정보 보호 대책
4) 익명화된 검사대상물일지라도 특정인이나 특정 소수집단을 알 수 있을 정도의 희귀한 유전자
대상 연구(사례분석, 가계도 분석 등)인 경우, 검사대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이 기술된 유전자연구 동의서를 획득해야 한다.
5) 법정서식의 동의서와 함께 동의서 설명문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유전자연구의 목적 및 연구 디자인 등의 상세한 설명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유전자에 대한 설명
② 채취할 검사대상물의 종류 및 양
③ 검사대상물 채취에 따르는 부작용 발생 위험
④ 구체적인 연구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설명
ⅰ) 연구에 사용하는 분석 방법, 비용
및 시간
ⅱ)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 및 결과의
범위와 의미
ⅲ) 분석 결과에 접근이 가능한 범위
6) 검사대상자의 가족력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경우, 가족 구성원의 권리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별도의 동의서를 받도록 권장한다.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현황 및 운영방침 등이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데 적절한지 심의할 것을 권장한다.
|
또한 생명윤리법 시행령(2007년 10월 신설)을
보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에 대한 언급이 있어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영 제13조의2,
별표1).
|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검사는 금지된다.
가. LPL 유전자에 의한 고지질혈증(고지혈증)
관련 유전자검사
나. Angiotensinogen 유전자에 의한 고혈압 관련 유전자검사
다. VDR 또는 ER 유전자에 의한 골다공증 관련 유전자검사
라. IRS-2 또는 Mt16189 유전자에 의한 당뇨병 관련 유전자검사
마. UCP-1·Leptin·PPAR-gamma·ADRB3(B3AR) 유전자에 의한
비만 관련 유전자검사
바. ALDH2 유전자에 의한 알코올 분해 관련 유전자검사
사. 5-HTT 유전자에 의한 우울증 관련 유전자검사
아. Mt5178A 유전자에 의한 장수 관련 유전자검사
자. IGF2R 또는 CALL 유전자에 의한 지능 관련 유전자검사
차. IL-4 또는 beta2-AR 유전자에 의한 천식 관련 유전자검사
카. ACE 유전자에 의한 체력 관련 유전자검사
타. CYP1A1 유전자에 의한 폐암 관련 유전자검사
파. SLC6A4 유전자에 의한 폭력성 관련 유전자검사
하. DRD2 또는 DRD4 유전자에 의한 호기심 관련 유전자검사
② HLA-B27 유전자에 의한 강직성척추염 관련 유전자검사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강직성척추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BCR/ABL 유전자에 의한 백혈병 관련 유전자검사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백혈병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치료 후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PHOG/SHOX 유전자에 의한 신장 관련 유전자검사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래리-웨일 연골뼈형성이상증(Leri-Weill dyschondrosteosis)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동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p53 유전자에 의한 암 관련 유전자검사와 BRCA1 또는
BRCA2 유전자에 의한 유방암 관련 유전자검사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해당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해당 질환이 이환된 것으로 확진된
사람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Apolipoprotein
E 유전자에 의한 치매 관련 유전자검사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인의 경우에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동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역할, 구성, 기능 및 운영방법
현재의 국제적인 GCP에 규정되어 있는 IRB의
역할을 구분해 보면, 임상연구계획서의 심의, 피험자 동의서의 검토, 그리고 승인된 연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IRB는
연구대상자의 인권, 복지, 권리, 존엄성이 연구자에 의해 침해받지 않으며, 연구 과정에서 연구대상자가
착취당하지 않도록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KGCP의 제8조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의 윤리적․과학적․의학적 측면을 검토․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로서 변호사 또는 종교인과 같은 1인 이상과
해당 시험 기관과 관련이 없는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시험자 및 의뢰자와 관련이 있는 자는 해당 임상시험에 대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의 명단과 이들의 자격을 기재한 문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문서화된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 활동 및 회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 기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표준작업지침서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사전 고지된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⑥ 임상시험에
대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한한다.
⑦ 시험책임자는
해당 임상시험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임상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심사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또한, IRB는 임상연구계획서의 윤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과학적 타당성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비과학적 연구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식 창출이 아닌 피험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게 되므로 비윤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IRB는 책임자가 임상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계획서가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피험자의 동의취득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IRB가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위험과
기대되는 이익이 정확히 기술되고 평가될 수 있는지, 피험자의 위험이 최소위험(minimal risk)보다 큰 지 혹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이 있는지, 예상되는 피험자 중에 취약계층이 있는지, 연구의 위험과 이익이 치료의 그것들과 분리되어 평가되는지 또는
이해갈등(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관계가 개입되어 있는지, 동의의 주체가 누구이며 피험자의 동의를 올바른 방식으로
얻는지, 안전을 보장하는 모니터링 장치가 적절한지, 그리고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다.
IRB 심의가 진행되는 흐름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데(2009년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IRB의 ‘심의흐름도’를 예로 설명), 정규심의 10일전까지
책임연구자에 의하여 연구계획서가 IRB에 제출되면 전문 간사 및 패널간사에 의하여 ‘면제 혹은 신속심의, 정규심의’ 대상여부가 우선 판단되고,
그 중에서 정규심의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신규과제들은 사전심사를 위하여 ‘책임심사위원과 사전심사위원’에게 전자파일 형식으로 보내지며, 책임심사위원은
7일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심사의견을 취합·조정하여 정규심의(매월 2회 개최되는)에서 연구내용 및 심의결과를 설명한다. 정규심의 시에는
정족수를 충족한 위원들이 이해상충관계(conflict of interest)를 먼저 확인한 후에 독립적으로 투표를 하여 그 결과를 ‘승인(및 시정승인),
보완(조건부 승인), 보완(재심의), 반려’로 구분하여 승인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또한 IRB 정규심의 진행순서의 예는 다음과 같다(2009년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IRB ‘정규심의 진행순서’ 참조).
① Quorum (성원 확인)
② Previous Minutes (전회 의사록 보고)
③ Agenda for The Meeting (회의 안건 설명)
④ Conflict of Interest (이익충돌위원 여부 확인 및 배제)
⑤ New Protocols and Consent Forms (신규 계획서에 대한 ‘정규심의’)
⑥ Expedited Review (‘신속심의’ 결과보고 및 추인)
⑦ Closed Studies (연구종료 보고 및 심의)
⑧ SAE Reports (중대이상사례 보고 및 심의)
⑨ Site Visit Report (현장방문평가 보고 및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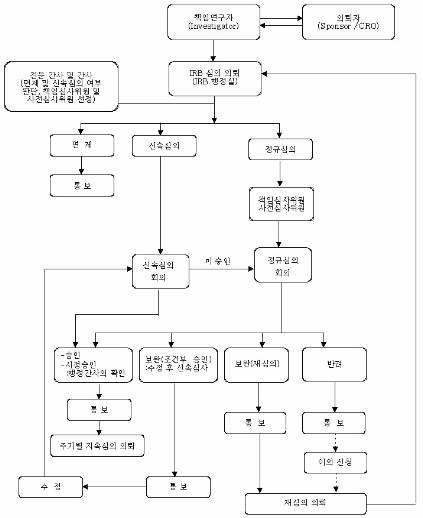
5. 피험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 기본조건 :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서 취득(informed
consent)
‘동의’란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해당 임상시험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이해한 후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동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그 것은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피험자가 임상시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피험자가 임상시험을 이해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임상 연구에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이다. 조금 더
부연하여 설명하면, 뉘른베르크 강령과 헬싱키 선언 그리고 이후의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보면,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참여자들은, 시험의 위험과 이득, 치료적 대안, 참여의 절대적 자유, 시험의 정확한 진행경과, 언제든
개인적 손해가 없이 시험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피험자 또는 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문서화된 동의서 서식, 피험자설명서 및 기타 문서화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임상시험은
연구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
② 임상시험의
목적
③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관한 정보 및 시험군 또는 대조군에
무작위 배정될 확률
④ 관혈적 시술(invasive procedure)을 포함하여 임상시험에서 피험자가
받게 될 각종 검사나 절차
⑤ 피험자가
준수하여 할 사항
⑥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의 실험적인 측면
⑦ 피험자(임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태아, 수유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영유아를 포함한다)에게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위험이나 불편
⑧ 기대되는
이익 또는 피험자에게 기대되는 이익이 없을 경우 해당 사실
⑨ 피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이나 종류 및 이러한 치료의 잠재적 위험과 이익
⑩ 임상시험과
관련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험자에게 주어질 보상이나 치료방법
⑪ 피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경우 예상 금액 및 이 금액이 임상시험 참여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
⑫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피험자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
⑬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여 여부 결정은 자발적인 것이며, 피험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손실이 없이도 임상시험에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임상시험 도중 언제라도 중도에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
⑭ 모니터요원, 점검을 실시하는 자, 심사위원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피험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임상시험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피험자의 의무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과 동의서 서식에 서명함으로써 피험자 또는
대리인이 이러한 자료의 직접열람을 허용함을 의미한다는 사실
⑮ 피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임상시험의 결과가 출판될 경우 피험자의 신원은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
⑯ 피험자의
임상시험 지속 참여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면 적시에 피험자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사실
⑰ 임상시험과
피험자의 권익에 관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거나 임상시험과 관련이 있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접촉해야 하는 사람
⑱ 임상시험
도중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여가 중지되는 경우 및 해당 사유
⑲ 피험자의
임상시험 예상 참여 기간
⑳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략의 피험자 수
¦ 이해를 돕기 위한 문제 ¦
가. 객관식 문제
(1) 의료윤리의 기본개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악행금지의 의무 - 회복 불능의 혼수상태의 환자에 대해서도 필요 없으나 처치를 시행함.
② 정의의 의무 - 효율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생명의 존엄성을 우선시 하여 정의를 실행함.
③ 선행의 의무 - 의업의 이타성으로 인하여 자율성, 악행금지, 정의 의무를 보다 우위에 있음.
④ 자율성 존중의 의무 - 내가 선의라 하더라도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음.
(2) 뉘른베르크 강령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① 인체실험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는 선택적이다.
② 연구대상자는 연구과정 중에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해를 감수할 수도 있다.
③ 실험에서 감수해야 할 위험의 정도가 그 실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보다 다소 상회할 수 있다.
④ 실험은 윤리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수행할 수 있다.
⑤ 실험을 하는 도중에 피험자는 자신이 더 이상 실험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면 실험을 끝낼 자유가 있다.
(3) IRB의 최소한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의학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의학적 측면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
② 비과학 분야의 위원이거나 또는 해당 시험 기관에 종사하지 않음으로 하여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중 한사람 정도만 포함해도 됨.
③ 윤리적 측면에서만 문제없으면, 과학적 타당성은 다소 재량껏 평가해 줄 수 있음.
④ 피험자의 동의취득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
⑤ 안전을 보장하는 모니터링 장치는 없더라도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면 윤리적으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것임.
나. 주관식 토론 문제
(1) 다음 두 개의 기사를 보고, ‘의료윤리의 원칙’과 ‘임상연구와 관련된 규약들’의 어떠한 원칙들이 위배되었는지 토론해 보시오.
(2) 다음의 ‘피험자 모집 광고’를 보고, 피험자 모집이 ‘타당’한지 아니면 어떠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토론해 보시오.
■ 토론자료 ■
서울대를 포함한
국내 대학병원 3곳이 다국적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용역을
받아 흡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울대와 전남대, 가톨릭대병원 임상시험센터는 필립모리스의 임상시험 대행회사인 ㅅ사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임상 시험’을 의뢰받아
최근 연구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54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이번 연구는 ‘아시아 성인 흡연자 및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담배연기 노출의 잠재적
위해 수준을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연구비만 10억원에 이른다. ㅅ사는 “일본에서도 540명을 대상으로 같은 연구를 벌이고 있는데 대학병원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립 대학병원까지 나서서 다국적 담배회사가 맡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버드·컬럼비아대 등 미국 주요대학들은 아예 담배회사로부터 연구 지원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독일·미국·스위스 등에서 담배회사의 자금을 받아 진행된 연구들이 담배회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내놓았다는 의혹을 사왔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들은 지난해 10월 “담배회사의 연구비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담배회사의 연구비 수령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국내 대학병원 3곳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는
지난달 이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애초 연구에 참여하기로 했던 경북대병원은 지난달 5일
연구윤리심의위가 담배회사가 의뢰한 연구라는 이유로 재심결정을 내렸다. 김일순 연세대 명예교수(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는 “담배와 관련된 연구는 세계적으로 이미 100만건이 넘게 나와 있다”며 “다국적 담배회사가 거액을 주고 학문적으로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는 흡연에 관한 연구를 맡긴 것은 연구
성과 이외의 목적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의과대학 교수는 “담배회사의 돈을 받아 흡연 관련 연구를 하는 것은 건설회사
돈을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 대학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가 이번 연구를 승인했다면 심의위의 심사기준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 책임자인 장○○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필립모리스가 덜 해로운
담배를 만드는 데 자료로 쓰일 것이고 서양에서 이미 2천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끝냈다”며 “한국에
해로울 게 없고 관심 없는 연구도 아닌데 서울대병원이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연구 심의를 맡은 김○○ 교수는 “심의위는 임상연구 과정에서 실험자와 피실험자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연구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계 1위 담배상표인 말보로 등을 판매하는 필립모리스는 “이번 연구는 흡연의 중독성과 질병 유발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위험성이 감소된 제품’
개발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며 “연구 결과는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 한겨레신문,
2007년 7월 5일자).
서울대병원, 외국담배회사 후원 담배연구 취소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가 국립 대학병원까지 나서서 담배 연구를 한다( 5일치 2면)는 비판을 고려해 해당 연구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윤리심의위는 취소 이유에 대해
지역 사회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돼 있는 표준운영지침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영지침을 보면 이미 승인된 과제라도 연구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재심의를 통해 연구 중지 또는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윤리위는 “과학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점은
재확인했다”며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 기초협약과 세계의사회의 담배 후원과 관련된 권고에
비춰 볼 때,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해당 연구는 서울대병원에서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윤리심의위 결정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서울대병원이 담배회사 후원 연구의 승인을 취소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어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도 담배회사의 지원금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5일 서울대와 전남대, 가톨릭대병원 임상시험센터는 필립모리스의
임상시험 대행회사인 ㅅ사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임상 시험’을 의뢰받아 연구에 들어간 사실을 보도했다. 전국에서 54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이 연구는 ‘아시아 성인
흡연자 및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담배연기 노출의 잠재적 위해 수준을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10억원이
지원되는 연구였다. 이에 대해 학계와 금연운동단체에서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 대학병원의 연구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했다(출처 : 한겨레신문, 2007년 7월
12일자).
복지부 '난자파문은 동서양 윤리적 시각차 때문' - 황우석 연구팀, 법 규정·윤리준칙
위배사실 없다 -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매매 의혹과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팀 여성연구원 두 명에게서 난자를 제공받았으며, 이들에게 실비를 제공한 사실을 황우석 교수도 최근에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IRB의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볼 때 연구팀의 난자 수급과정에서의 『법 규정 및 윤리준칙위배 사실은 없었음』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난자파문의 문제는 인간적 존엄성, 윤리관에 대한 '동서양 문화적 차이'때문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가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체세포 줄기세포연구를 위한 난자수급 자체조사 결과 보고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IRB는 전ㆍ현직 연구원들 34명에 대한 진술서 징구, 당사자들에 대한 전화통화 및 직접대면 조사, 각종 언론보도자료 수집 및 분석 등 법적 권한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되었다(출처 : 폴리뉴스,
2005년 11월 24일자).
2명 연구원으로 부터 난자제공, 실비지급
사실 황교수 최근에 알아
보건복지부는 "연구팀은 2004 사이언스 논문 연구에서 OOO 병원으로부터 난자를
제공 받았으며, OOO 이사장은 2003년 말까지 난자제공 일부 여성에게 평균 150만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OOO 이사장은 연구팀에 난자를 공여할 때 기증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문제가 없는 난자임을 명백히 확인해 주었다"며
"황우석 교수도 일부 난자제공자에 대해 실비 등이 지급된 사실을 최근에 인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난자를
기증한 두 명의 여성연구원은 연구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열에 기초한 자발성에 터 잡아 자신의 희생으로 연구 성과를 이루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고 "또 이 두 명의 연구원 이외에 또 다른 난자기증 사례가 없어 연구팀 내에서 은연중에 난자기증 요구 분위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난제를 제공한 여성연구원은 지난 2004년 5월 네이처지의 난자제공을 인정한 1차 답변
후 자신이 이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번복 인터뷰를 하였으며, 이후 황우석 교수는 연구원들과 면담하였고 연구원들이 난자 제공 사실을 시인,
그 시점이 2004년 5월말 경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OOO 이사장이 제공한 150만원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것도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7413호, 2005년 1월1일 시행)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실들로 법 규정 위배는 없다고 밝혔다. 법적,
윤리적 문제없다 - 동서양 문화차이가 큰 문제
복지부는 "강요나 회유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영리목적의 대가관계도 아니므로 윤리준칙 위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이번 사태는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가치에 대한 동서양 문화차이에서 연유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책임자의 불가권유를 수용하지 않고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난자를 제공한바 서양과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난자제공 당시는 국내외적으로 난자제공 문제만을 특정하여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의학적 실험에서 일반적으로
원용되는 헬싱키 선언 역시, 고용·피고용등 특수 관계인 경우라 하여 전면 금지가 아닌 내재적 기준에
입각해 신중을 기하라는 것으로 본 사안이 헬싱키 선언에 배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향후 복지부는 난자획득절차에 대한
법 규정과 윤리준칙 제정 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행정지원 체계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남성형 탈모증 치료에 대한
임상 시험
지원자 모집에 대한 공고
본원 피부과에서는 남성형 탈모증에 대한 치료 (Finasteride 및 Minoxidil)의 효과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만 18~41세의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7월 초부터 6개월 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든 각종 검사 및 투약에 대한 일체 비용은 무료이며, 남성형 탈모증으로 고생하시는 병원 직원 및 직원 분들의 가족(직계 및 사촌 이내)도
가능합니다.
선착순 18명 한도 내에 실시하므로
미리 피부과 외래에 등록하셔야 하며, 추가 문의 사항은 피부과 외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명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 ○○○○○병원
피부과, ○○○)○○○-3765
|
■ 참고자료
■
WORLD MEDICAL ASSOCIATION DECLARATION OF HELSINKI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Adopted by the 18th WMA General Assembly, Helsinki,
Finland, June 1964, and amended by the:
29th WMA General Assembly, Tokyo, Japan,
October 1975
35th WMA General Assembly, Venice, Italy,
October 1983
41st WMA General Assembly, Hong Kong, September 1989
48th WMA General Assembly, Somerset West, Republic of South Africa,
October 1996
52nd WMA General Assembly, Edinburgh, Scotland,
October 2000
53rd WMA General Assembly, Washington 2002 (Note of
Clarification on paragraph 29 added)
55th WMA General Assembly, Tokyo 2004 (Note of
Clarification on Paragraph 30 added)
59th WMA General Assembly, Seoul, October 2008
A. INTRODUCTION
1.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has developed the Declaration of
Helsinki as a statement of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including research on identifiable human material and data.
The Declaration is
intended to be read as a whole and each of its constituent paragraphs should
not be applied without consideration of all other relevant paragraphs.
2. Although the Declaration is addressed primarily to physicians, the
WMA encourages other participants in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to adopt these principles.
3. It is the duty of the physician to promote and safeguard the health
of patients, including those who are involved in medical research. The
physician's knowledge and conscience are dedicated to the fulfillment of this
duty.
4. The Declaration of Geneva of the WMA binds the physician with the
words, “The health of my patient will be my first consider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de of Medical Ethics declares that, “A physician shall act in
the patient's best interest when providing medical care.”
5. Medical progress is based on research that ultimately must include
studies involving human subjects. Populations that are underrepresented in
medical research should be provided appropriate access to participation in
research.
6. In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the well-being of the
individual research subject must take precedence over all other interests.
7. The primary purpose of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is
to understand the causes, development and effects of diseases and improve
preventive, diagnostic and therapeutic interventions (methods, procedures and
treatments). Even the best current interventions must be evaluated continually
through research for their safety, effectiveness, efficiency, accessibility and
quality.
8. In medical practice and in medical research, most interventions
involve risks and burdens.
9. Medical research is subject to ethical standards that promote
respect for all human subjects and protect their health and rights. Some
research population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and need special protection.
These include those who cannot give or refuse consent for themselves and those
who may be vulnerable to coercion or undue influence.
10. Physicians should consider the ethical, legal and regulatory norms
and standards for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in their own countries as
well as applicable international norms and standards. No national or
international ethical, legal or regulatory requirement should reduce or
eliminate any of the protections for research subject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B. PRINCIPLES FOR ALL MEDICAL RESEARCH
11. It is the duty of physicians who participate in medical research to
protect the life, health, dignity, integrity, right to self-determination,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personal information of research subjects.
12.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must conform to generally
accepted scientific principles, be based on a thorough knowledge of the
scientific literature, other relevant sources of information, and adequate
laboratory and, as appropriate, animal experimentation. The welfare of animals
used for research must be respected.
13. Appropriate caution must be exercised in the conduct of medical
research that may harm the environment.
14. The design and performance of each research study involving human
subjects must be clearly described in a research protocol. The protocol should
contain a statement of the ethical considerations involved and should indicate
how the principles in this Declaration have been addressed. The protocol should
include information regarding funding, sponsors, institutional affiliations, other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incentives for
subjects and provisions for treating and/or compensating subjects who are harmed
as a consequence of participation in the research study. The protocol should
describe arrangements for post-study access by study subjects to interventions
identified as beneficial in the study or access to other appropriate care or
benefits.
15. The research protocol must be submitted for consideration, comment,
guidance and approval to a research ethics committee before the study begins.
This committee must be independent of the researcher, the sponsor and any other
undue influence. It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untry or countries in which the research is to be performed as well as
applicable international norms and standards but these must not be allowed to
reduce or eliminate any of the protections for research subject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The committee must have the right to monitor ongoing studies.
The researcher must provide monitoring information to the committee, especially
information about any serious adverse events. No change to the protocol may be
made without consideration and approval by the committee.
16.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must be conducted only by
individuals with the appropriate scientific training and qualifications.
Research on patients or healthy volunteers requires the supervision of a
competent and appropriately qualified physician or other health care
professional. The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research subjects must
always rest with the physician or other health care professional and never the
research subjects, even though they have given consent.
17. Medical research involving a disadvantaged or vulnerable population
or community is only justified if the research is responsive to the health
needs and priorities of this population or community and if there is a
reasonable likelihood that this population or community stands to benefit from
the results of the research.
18. Every medical research study involving human subjects must be
preceded by careful assessment of predictable risks and burdens to the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nvolved in the research in comparison with foreseeable
benefits to them and to other individuals or communities affected by the
condition under investigation.
19. Every clinical trial must be registered in a publicly accessible
database before recruitment of the first subject.
20. Physicians may not participate in a research study involving human
subjects unless they are confident that the risks involved have been adequately
assessed and can be satisfactorily managed. Physicians must immediately stop a
study when the risks are found to outweigh the potential benefits or when there
is conclusive proof of positive and beneficial results.
21.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may only be conducted if
the importance of the objective outweighs the inherent risks and burdens to the
research subjects.
22. Participation by competent individuals as subjects in medical
research must be voluntary. Although it may be appropriate to consult family
members or community leaders, no competent individual may be enrolled in a
research study unless he or she freely agrees.
23. Every precaution must be taken to protect the privacy of research
subjects and the confidentiality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to minimize
the impact of the study on their physical, mental and social integrity.
24. In medical research involving competent human subjects, each
potential subject must be adequately informed of the aims, methods, sources of
funding, any possible conflicts of interest, institutional affiliations of the
researcher, the anticipated benefits and potential risks of the study and the
discomfort it may entail, and any other relevant aspects of the study. The
potential subject must be informed of the right to refuse to participate in the
study or to withdraw consent to participate at any time without reprisal.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specific information needs of
individual potential subjects as well as to the methods used to deliver the
information. After ensuring that the potential subject has understood the
information, the physician or another appropriately qualified individual must
then seek the potential subject’s freely-given informed consent, preferably in
writing. If the consent cannot be expressed in writing, the non-written consent
must be formally documented and witnessed.
25. For medical research using identifiable human material or data,
physicians must normally seek consent for the collection, analysis, storage
and/or reuse. There may be situations where consent would be impossible or
impractical to obtain for such research or would pose a threat to the validity
of the research. In such situations the research may be done only after
consideration and approval of a research ethics committee.
26. When seeking informed consent for participation in a research study
the physician should be particularly cautious if the potential subject is in a
dependent relationship with the physician or may consent under duress. In such
situations the informed consent should be sought by an appropriately qualified
individual who is completely independent of this relationship.
27. For a potential research subject who is incompetent, the physician
must seek informed consent from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These
individuals must not be included in a research study that has no likelihood of
benefit for them unless it is intended to promote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represented by the potential subject, the research cannot instead be performed
with competent persons, and the research entails only minimal risk and minimal
burden.
28. When a potential research subject who is deemed incompetent is able
to give assent to decisions about participation in research, the physician must
seek that assent in addition to the consent of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The potential subject’s dissent should be respected.
29. Research involving subjects who are physically or mentally
incapable of giving consent, for example, unconscious patients, may be done
only if the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that prevents giving informed consent
is a necessary characteristic of the research population. In such circumstances
the physician should seek informed consent from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If no such representative is available and if the research
cannot be delayed, the study may proceed without informed consent provided that
the specific reasons for involving subjects with a condition that renders them
unable to give informed consent have been stated in the research protocol and the
study has been approved by a research ethics committee. Consent to remain in
the research should be obtained as soon as possible from the subject or a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30.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all have ethical obligations with
regard to the publication of the results of research. Authors have a duty to
make publicly available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 on human subjects and are
accountable for the completeness and accuracy of their reports. They should
adhere to accepted guidelines for ethical reporting. Negative and inconclusive
as well as positive results should be published or otherwise made publicly
available. Sources of funding, institutional affiliat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 should be declared in the publication. Reports of research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is Declaration should not be accepted for
publication.
C. ADDITION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COMBINED WITH MEDICAL
CARE
31. The physician may combine medical research with medical care only
to the extent that the research is justified by its potential preventive,
diagnostic or therapeutic value and if the physician has good reason to believe
that participation in the research study will not adversely affect the health
of the patients who serve as research subjects.
32. The benefits, risks, burdens and effectiveness of a new
intervention must be tested against those of the best current proven
intervention,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The use of
placebo, or no treatment, is acceptable in studies where no current proven
intervention exists; or
• Where for
compelling and scientifically sound methodological reasons the use of placebo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efficacy or safety of an intervention and the
patients who receive placebo or no treatment will not be subject to any risk of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Extreme care must be taken to avoid abuse of this
option.
33. At the conclusion of the study, patients entered into the study are
entitled to be informed about the outcome of the study and to share any
benefits that result from it, for example, access to interventions identified
as beneficial in the study or to other appropriate care or benefits.
34. The physician must fully inform the patient which aspects of the
care are related to the research. The refusal of a patient to participate in a
study or the patient’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study must never interfere
with the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35. In the treatment of a patient, where proven interventions do not
exist or have been ineffective, the physician, after seeking expert advice,
with informed consent from the patient or a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may use an unproven intervention if in the physician's judgement
it offers hope of saving life, re-establishing health or alleviating suffering.
Where possible, this intervention should be made the object of research,
designed to evaluate its safety and efficacy. In all cases, new information
should be recorded and, where appropriate, made publicly available.
참고문헌
이해관계
conflict
of interests
☞ 학습목표
이해관계의 개념과 폐해 가능성을 숙지하고 이에 대해 공개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야 한다.
☞ 구체적 학습목표
1. 이해관계의 개념을 이해한다.
2. 이해관계의 중요한 영역에 대해 설명한다.
3. 이해관계의 윤리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국가, 기관, 학술지,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한다.
연구자들은 지식 향상이나 사회에 공헌, 전문성 향상과 함께 개인적인 이익과 만족도 추구한다. 이러한 이익은 사회적으로 정당하며 개인에게 커다란 동기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익은 연구자간에 충돌을 일으키기 하고 이러한 이익으로 인해 과학이나 연구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연구자가 기구와의 관계에 의해서 학술 연구나 과학 연구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은 책임의 문제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관계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며 현재의 상황에서는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다루고 어떤 원칙으로 해소하는 가의 문제이다.
가. 정의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COPE)는 표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해관계는 저자, 검토자, 편집자가 충분히 명백하지 않고 무엇을 출판할 것인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것에 의해서 독자들을 잘못 인도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다. 이해충돌은 개인적일 수 있고, 상업적, 정치적, 학술적, 재정적일 수 있다.
‘재정적’이라는 의미에는 고용, 연구 자금, 주식(지분) 소유, 여행이나 강연료 지급, 자문 등을 포함한다.”
의학 잡지 편집인 국제 협의체(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서 제정한 생의학 잡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에서는 출판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저자 관련, 연구 지원 관련, 편집인 관련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으며 이해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자(또는 소속 기관),
전문가심사자, 편집인 등과 같이 원고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직접 관련된 사람이 원고를 공평하고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할 만큼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이해의 관계를 가지면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나. 영역
미국의 연구 윤리 관련 공식 기구인 Office of
Research Integrity(ORI)에서 발간한 “책임 있는 연구 입문서(Introduction
to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에서는 이해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1) 금전적인 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s)
재정적 이해관계에는 고용, 연구 자금, 주식(지분) 소유, 여행이나 강연료 지급, 자문금전적인 이득이 모두 포함된다. 금전적 혹은 재정적 이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연구자들은 저작권 등을 통해 이득을 얻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 공공연구 지원금을 통해 개발된 아이디어의 소유권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상당수 국가에서 그 소유권을 연구 기관에 부여한다. 이러한 정책은 법률에 기초한다. 1980년 미국에서 통과된 ‘베이-돌법’은 저작권, 특허, 등록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 기관이 연구 아이디어를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개인적인 이득으로 인해 연구자의 근본적인 의무인 진실과 정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금전적인 이득은 연구 결과를 과다하게 강조하거나 축소시키거나 연구 부정행위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연구자들에게 사이의 연구비 지원 경쟁은 금전적인 충돌을 야기한다. 연구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연구비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업무 활동에 있어 이해 상충의 문제(Conflicts of commitment)
이 경우는 연구자들이 연구 시간이나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 있어서 경쟁적인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구자들은 대체로 여러 연구비 지원 프로젝트에 관여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신청하고 학생을 가르치고 상담하며 전문적인 회의에 참석하고 강연하며 동료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환자를 보는 임상의사인 경우에는 환자를 보는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런 활동들은 모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첫째, 시간의 배분이 문제가 된다. 연구자들은 시간 배분에 대한 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그러한 규칙에는 계약이나 연구 과제에 명시한 특정 시간의 시간을 투여하는 것, 동일한 기간에 두 곳에서 연구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것, 연구 기관이나 기관의 정책에서 시간에 대한 규칙이 있으면 지키는 것 등이다.
둘째는 학생들과 관계가 문제가 된다. 연구 프로젝트에 학생이나 전공의, 조교 등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자는 이들의 멘토로서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와 연구 자체의 완성도 혹은 벤처기업이라면 기업으로서 이윤 추구라는 업무 자체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원칙은 없지만 이에 대해 대비하고 사전에 미리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이 좋다.
셋째는 자원의 사용의 문제이다. 연구 지원금으로 구입한 장비와 재료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 기관을 옮길 때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연구자가 해당 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부적절한 행동이 될 수 있다. 장비뿐만 아니라 줄기 세포나 특정 균주, 실험동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3) 사적인 이해관계, 지적 이해관계
연구자들은 연구를 계획하거나 수행할 때 그리고 보고나 심사를 할 대 개인적인, 사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논문을 심사할 수도 있고 가까운 동료나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이 제출한 연구비 지원 신청서를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금지되는데 이 경우 주어진 증거만으로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적 이해관계는 이보다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예들 들어 어떤 연구자가 특정 연구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분야의 윤리적인 문제에 강한 의견이 있으면 연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도 해당 사항에 대해 명백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다. 이해관계는 논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실제로 일부 이해관계는 피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 자체가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구에 있어서 산업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비 지원 자체가 연구 내용 혹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자체가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예들 들어 Stelfox
등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한 칼슘 길항제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기업의 후원을 받았는지 여부로 구별하였을 때 약제사용을 권고하는 경우가 후원을 받은 연구에서 훨씬 더 많았다.
Bekelman 등은 실제로 재정적 이해관계가 실제 논문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였는지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총 37편의 논문을 분석하였을 때 기업에서 후원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론의 차이가 있었으며(약 3.6배), 이 경우는 출판의 제한이나 자료 공유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라. 대책
‘이익’의 추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그러한 이유로 이해관계를 피할 수는 없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 가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해관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해관계 혹은 잠재적인 이해관계를 밝히는 것이다(disclose). 이러한 행위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또 자발적인 것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선언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크게 연구를 수행하는 단계와 연구를 출판하는 단계에서 각각 이에 걸맞은 이해관계 관련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며 해당 단계마다 적절하게 이해관계 관련성을 밝히고 만일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연구 수행, 계획서 심사, 분석과정, 논문 접수, 전문가 심사 과정, 연구 결과물의 사후 처리 과정 등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이해관계 관련 대책은 크게 국가, 기관, 전문가 단체 등에서 제정한 이해관계 관련 지침 혹은 강령과 출판 관련 사항이 있다.
4) 국가, 기관, 전문가 단체의 지침
국가
현재 이해관계 관련된 정부 지침이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관리되어 있지는 않다. 현재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미국이다. 1980년 미국에서 통과된 ‘베이-돌법’은 저작권, 특허, 등록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 기관이 연구 아이디어를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1990년 미국의 NIH와 국립과학재단은 1990년 금전적인 이득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3).
1)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다면 보고한다.
2) 중대한 금전적 이해관계를 관리하고 경감시키고 해소한다.
3) 이러한 충돌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해 차후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중대한 금전적 이해관계는 매년 추가적인 1만 달러 이상의 소득과 연구 결과로부터 이익을 보는 단체의 5% 이상의 주식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 전에 제정된 “연구 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안”에는 이해관계 관련 사항이 없다.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기관
여러 연구 기관들은 나름의 이해관계 정책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기관 IRB에는 이해상충에 대한 부분이 있다.
아래 부분은 강동성섬병원 IRB SOP 중에서 이해 상충에 대한 것이다.
|
이해갈등관계
이해갈등관계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강동성심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와
위원장은 이해갈등관계를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피험자를 보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 위원회의
정책은 자신이
이해갈등관계에 있는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도
해당 위원이
위원회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 이외에는
심의, 권고, 혹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심의
받기 위해
제출되는 어떠한
계획서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지게
될 실제적이거나
가능한 모든
이해갈등관계에 대해 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즉시 공개해야
하며, 해당 계획서의
논의나 권유에
대한 참여를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계획서 제출자가
위원회 위원이
잠재적인 이해갈등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연구자는 해당
위원이 계획서의
심의에서 제외되도록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문제의
위원에게 이해갈등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합당함을 보여주는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어떠한 위원이라도
이해갈등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이외에는
위원회 검토나
승인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해갈등관계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위원이 잠재적으로
경쟁적인 연구
과제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
� 재정이나 지적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경쟁상에서
불공평한 이득을
줄 경우
� 위원의 개인적
편향이 편파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경우
|
전문가 집단과 학술지의 정책
수많은 전문가 집단이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거나 보고서를 발행해 왔다.
아래 예는 미국 의과대학협회(AAMC)의 임상실험에서 금전적 이해 상충에 대한 내용이다3).
|
AAMC Task Force Recommendations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in Clinical Research(December 2001)
B. In the event of compelling circumstances, an individual holding significant financial interests in human
subjects research may be permitted to conduct the research. Whether the
circumstances are deemed compelling will depend in each case upon the nature
of the science, the nature of the interest, how closely the interest is
related to the research, and the degree to which the interest may be affected
by the research….
C. Institutional policies should require full prior
reporting of each covered individual's significant financial interests that
would reasonably appear to be affected by the individual's research, updated
reporting of any relevant change in financial circumstances, and review of
any significant financial interests in a research project by the
institution's COI committee prior to final IRB approval of the research. COI
committee findings and determinations should inform the IRB's
review of any research protocol or proposal, although the IRB may require
additional safeguards or demand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he financial
interest….
|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학술지에도 연구자에게 실질적인 혹은 잠재적인 금전적 상충 관계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래 예를 뉴잉글랜드 저널에 있는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정책>에 있는 내용이다3).
|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Conflict of Interest Policy
June
13, 2002
[B]eginning with this issue
of the Journal, we have modified the statement in Information for Authors to
read as follows:
Because
the essence of reviews and editorials is selec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literature, the Journal expects that authors of such articles will not have
any significant financial interest in a company (or its competitor) that
makes a product discussed in the article.
The
addition of the word “significant” acknowledges that not all financial
associations are the same. Some, such as the receipt of honorariums for
occasional educational lectures sponsored by biomedical companies, may be
appropriately viewed as minor and unlikely to influence an author's judgment.
Others, such as ownership of substantial equity in a company, are of greater
concern. It is our intent to focus on the financial relationships that, in
our judgment, could produce bias, or the perception of bias, in an article.
|
중대한 이해관계 문제의 관리
연구자가 만일 정부나 기관, 학술지 등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이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있어야 한다.
관리 방안에는 1) 이해관계를 공개하여 다른 사람이 그에 따라 행동하게 한다, 2) 연구를 모니터링하거나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인한다, 3) 연구 과정의 결정적인 단계(예: 데이터의 해석, 특정 기관에 심의를 요청할지 여부 등)에는 배제한다. 등이 있다.
만일 이러한 방법으로 충분히 관리되지 못한다면 주식 소유 지분 포기 등의 조처를 시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아닌 연구 행정조직, 연구비 지원기관, 학술지 편집장, 이해 상충 대책 위원회 등에서 이해 상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5) 출판과 관련된 이해관계 지침
ICMJE)에서 제정한 생의학 잡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2)에서는 출판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저자 관련, 연구 지원 관련, 편집인 관련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저자 관련 이해관계
저자가 원고를 제출할 때, 그것이 논문이든 서한이든 간에 해당 연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정 사항이나 인간관계를 공지할 책임이 있다. 특히 모호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자는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내용은 표지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이해관계 공지문”에 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커버 레터에 추가적인 사항을 적어 원고와 동봉할 수 있다. 저자는 논문작성을 도운 사람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있으면 밝혀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이해관계” 가능성도 밝히고 필요하면 원고 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연구 지원 관련 이해관계
개인회사나 영리단체,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연구자가 그런 사실 때문에 연구결과가 한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사실을 예상하여 연구의 결과를 불신을 받을 수도 있다.
연구자는 믿을만한 연구 결과를 제출할 윤리적인 책무가 있으며, 연구의 재정 지원자의 역할을 밝혀야 하며 필요하다면 연구계획,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 보고서의 작성 그리고 출간에 재정지원자가 참여한 내용을 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편집인은 재정 지원을 받거나 연구결과에 따라 재정적 이익이 걸려있는 연구를 한 저자에게 자료의 내용과 자료 분석과정이 정확했다는 사실에 대한 보증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편집인은 연구논문의 출간을 결정하기 전에 상세한 연구 계획과 관련된 첨부서 사본과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으며 만약 재정 지원자가 저자 연구 보고서를 출간할 권리를 통제할 자격이 있다면 그 연구 논문을 출간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편집인, 전문가 심사자(peer reviewers) 관련 이해관계
편집인은 “이해관계” 가 명백하거나 가능성이 많은 외부의 전문가심사자, 예를 들어 저자와 같은 연구실이나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며, 저자는 그런 사림이 전문가심사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편집인을 도와야 한다. 필요하면 저자에게 우려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요청한다. 전문가심사자가 원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가심사자의 판단으로 검토하기에 부적합한 원고도 가려내어야 한다. 전문가심사자는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심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심사하는 미출판 연구자료 내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원고를 게재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편집인도 그들이 다루는 연구 결과나 논문에 개인적, 직업적, 또는 재정적으로 연관이 전혀 없어야 한다. 만약 편집과정에 참여하는 다른 직원이 있다면 그들도 현재 진행되는 연구와 재정적으로 이익 관련이 있는지 밝혀야 하며,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논의 과정에서 빠져야 한다. 편집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편집에 관련하여 얻은 어떠한 정보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편집인은 잡지를 출간하는 과정에 관련된 직원의 “이해관계” 가능성에 관련된 진술문을 정규적으로 출판해야 한다.
마. 결론
이해 갈등은 “전문가의 일차적 이득(환자의 이득 혹은 연구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에 이차적인 이득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차적 이득 중 대표적인 것은 재정적, 금전적인 것이며 누구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인 이득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이해는 존재하며 이러한 이해는 모두가 동일하지 않고 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없애려는 노력은 정당하지 않다.
영국의 COPE는 이해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의 네 가지 행동을 권고하였다1).
(1) 연구자, 저자, 검토자는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에 대해서 편집자에게 밝혀야 한다.
(2) 편집자는 독자에게 이해관계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만일 의심스러우면 밝혀라.
(3) 편집자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 그리고 편집 직원, 간행위원회(editorial boards), 관리자, 소유자(owners)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4) 때때로 이해관계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출판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출판 여부 결정에 일부 사람(편집자나 검토자)이 제외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한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차적 이득의 훼손 가능성을 미리 감지하여 이를 공지하는 것이며 이러한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교육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 이해를 위한 문제
객관식 문제
1. A 연구자는 박사 과정과 박사후 과정을 통해 우수한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화학물의 합성에 성공하였고 이를 임상 실험에 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 물질에 대한 특허의 출원에 착수한 상태이며 유망한 벤처 기업에서 그를 스카우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화학물의 소유자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1) 이 화학물에 대해 연구했던 대학
2)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킨 박사후 과정의 대학
3) 앞으로 근무할 기업의 고용주
4) 현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힘들게 노력한 자신
5) 그의 교육에 기여하고 그의 연구 대부분을 지원해준 사회
2. 다음 중 연구자로서 추구해야 할 일차적인 이득(이해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 재정적 이득
2) 사회적 명성
3) 진실의 추구
4) 후진 연구자 양성
5) 많은 연구비의 획득
3. 이해 상충과 관련된 윤리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 활발한 내부 고발자
2) 공개(disclose)
3) 효율적인 감시체계
4) 공정한 사후 관리 체계
주관식 토론 문제
1. 미국의 경우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보고가 필요한 중대한 이해관계로 미화 1만 불, 5%의 재산 지분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2. 연구자들이 연구로부터 개인적인 수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올바른가?
참고문헌
출판과 지적재산권Publish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 학습목표
지적재산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것이 연구결과의 출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구체적 학습목표
1. 학술 연구에서 출판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한다.
2.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개념을 설명하고 일반적인 연구논문에 적용한 사례를 예시한다.
3.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에 대하여 설명한다.
가.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자가 학술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른 답이 있겠으나 자기만족을 위해서라거나 학문의 발달이나 인류에 공헌을 한다는 일반적인 목표는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이다.
그 연구의 목적이 순전히 자기만족뿐이며 이를 위해 연구의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였고 그 결과를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갖춘다면 연구자에게 어떤 사회적 책임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연구는 생각하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최소한 자신의 연구 분야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기를 원할 것이며, 그럴 가능성이 높은 연구 일수록 유형무형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연구의 결과를 타인과 공유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비공식적인 구두 발표나 학회지를 통한 발표, 공개발표 등이 그 주된 유형인데 이러한 행위에는 특정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 연구의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정직하고 효율적이며, 편견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편견은 연구의 결과를 왜곡시켜서 거짓 내용을 사실로 오도할 것이며, 정직하지 못한 것도 같은 결과를 낳는다. 효율성은 연구자의 관점이 아니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연구 전체나 혹은 일부라도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발표하는 것은 그 연구에 투자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 것이며, 연구의 발표에 관여한 모든 자원들이 가치 없이 사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연구자의 기본 의무이며, 연구자가 소속된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규범을 통해 이를 위반하는지 감시를 한다. 이것은 보통 연구 윤리와 같은 형태로 자리 하게 되는데 그 중 특별한 경우로 법률을 통한 규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법률 형태의 규제는 연구 윤리보다 좁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어떠한 행위의 결과를 더 중시하여 그 결과에 대해 유형의 책임을 묻는 형태를 취한다. 이 과정에는 지적재산권이라 불리는 개념이 기본 바탕이 된다.
여기에서는 우선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저자 문제를 포함하는 출판 윤리 등 윤리적인 측면은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는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모든 보호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형태가 없는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하여야만 보호가 되며 보호기간이 대략 10-20년 정도이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를 그 보호기간으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학술 연구와 관련되는 것은 주로 저작권이다.
1) 저작권(copyright)
저작권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저작물에 속하는 것으로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다. 연구의 결과를 기술하는 연구 논문도 이 대상이 되며, 공공장소에서 발표를 한 강연도 마찬가지이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2차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것도 창작물로 인정되며 마찬가지로 저작권의 대상물이다. 편집저작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원저작물을 편집한 것으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역시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된다.
이러한 저작물들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을 통해 그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리한다.
2)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제정 당시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으며 그 후 개정이 될 때 마다 그 내용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왔다. 이러한 논란은 우리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이해득실을 달리하므로 자신의 권익을 높이려고 움직인 결과이기도 하며, 우리 사회에서는 그 동안 오랜 세월을 이에 관해서 법 보다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관리해온 관습 때문이기도 하다.
법리적으로 보자면 저작권법은 헌법을 그 배경으로 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 정의사회의 이념, 평화추구의 이념과 함께 문화민족의 이념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으며, 헌법 제22조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저작권법은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대상 저작물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저작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술 연구의 결과인 연구 논문은 이 중에서 어문저작물에 속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의 대상 저작물이다.
또 이 법에서는 저작권의 개념에서 소개한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학술연구에 적용한다면 연구 결과를 번역하거나 일부를 변형하여 새롭게 편집한 것도 독창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번역이나 편집이 원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권의 구체적 개념 중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다.
가) 저작인격권
저작권 중의 일부인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이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저작물을 공표하고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하는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이 있으며 이는 모두 저작자에게만 귀속되는 고유한 권리이다.
학술 논문 등과 같은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나)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권리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흔히 이야기되는 것으로는 복제권과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같은 것들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권리들은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데 저작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특정하고 있다. 즉 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②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③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④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⑥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⑦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⑧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⑨ 점자에 의한 복제, ⑩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⑪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⑫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의 합당한 요건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인정된다.
또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언급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등은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이런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계속 유지되며 사망 후 50년간 존속된다.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50년간 유지된다. 단체명의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 연구논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연구의 결과를 학술지를 통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1) 연구의 아이디어
어떤 학술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가다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경우에 연구 윤리라는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각도로 논의가 필요할 것이지만, 저작권법으로는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저작권법의 대상은 저작물이며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외부로 나타내어진다고 하는 것이 꼭 유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강연이나 발표회 등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라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자면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떤 장소 등에서 공개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설계(study design)
연구에 있어서 연구 방법과 관련된 연구 설계는 어떨까? 가령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 이름난 연구 설계를 채용하는 경우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문제가 있고, 또 새로운 연구 설계를 고안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연구 설계에 대해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의 기본 요건은 독창성이다. 연구 설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학술적인 성과의 연속이라는 측면이 강하므로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또 누군가가 내용을 일부 바꾸고 명명을 한다고 하여도 독창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3) 문헌의 인용
자신의 연구 논문에 다른 연구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원저자의 저작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저작권법에서는 어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자신의 논문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내용이 종이 되는 관계가 분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논문 내용과 인용되는 내용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성실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 인용의 대상이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사실도 유념하여야 하는데, 비공개 저작물이라면 원저자의 허락 없이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경우에도 출처의 표시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4) 저자의 표시
의학의 학술 연구는 흔히 여러 사람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연구논문도 여러 사람이 공동 저자로 발표되게 된다. 이럴 경우 공동저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적 기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잣대가 된다. 단순히 일상적인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는 공동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다른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저작권법의 정신으로는 일단 공동저작자가 되면 별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모든 저작자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이 임의로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도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학술지 게재
저작권은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연구 논문도 기술을 마치면 저자들에게 저작권이 인정된다. 기술된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하는 과정은 이와 같은 저작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이며, 그 범위는 계약서에서 정하게 된다. 대개의 학술지는 연구 논문을 투고 받을 경우 저자들과 저작권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양도 범위에 관한 세세한 내용은 없이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자구로만 보자면 저자는 저작권법에 있는 모든 권리를 학술지에 이양하는 것으로, 이후에 자신의 논문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해석으로,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복제·공연·방송·전시·배포권만이 양도되고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학술 논문과 관련하여 아직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없는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학술지는 출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배타적인 권리는 갖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연구 논문을 이용한 2차 저작이나 기타 지적재산권의 행사는 여전히 저자의 권리로 인정될 것이다.
6) 전자출판 학술지
최근에는 전자 출판을 하는 학술지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종이 학술지와 병행하여 전자 출판을 하기도 하고 전자 출판으로만 학술지를 내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 전자 출판도 똑같은 출판이며 저작자의 권리는 달라질 것이 없다.
전자출판에 의해 만들어진 컴퓨터 파일을 다른 곳에 옮기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므로 원저작자의 지적재산권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링크(link)를 하는 경우라면 링크를 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소를 표시하여 이용자가 그에 따라 열람을 하게하는 단순 링크라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지만,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나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헌의 인용 등의 경우에도 종이 학술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라. 이해를 위한 문제
객관식 문제
1. 새로 개발 된 약제 X는 동맥경화증에 의한 뇌혈류 저하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연구자 A 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실험용 쥐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1년 동안 50마리의 개체에게 약물을 투여한 결과 약간의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하였다. 이에 이 결과를 학술지 '갑'에 게재하였다. 그 후 연구자 A는 동일한 상태의 실험용 쥐 50 마리를 대상으로 다시 실험을 하였으며, 이번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연구자 A는 지난번의 실험과 이번의 실험을 합하여 100 마리의 개체에 대한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학술지 '을'에 투고하여 게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자 A의 행위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가?
1) 정상적인 학술 연구 발표 과정
2) 같은 실험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신의 위반
3) 동일한 실험의 반복하는 중복 연구
4) 중복 발표에 따른 사회자원의 효율성 저하
5) 부정적인 결과를 재연한 부도덕성
2. 다음 중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1) 타인의 연구논문 결과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학생들에게 교육
2) 전자 출판 된 타인의 논문을 복사하여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시
3) 저작권법에 대한 판례를 법원의 허가 없이 복사하여 일반에게 배포
4) 옆 동료의 연구 아이디어를 모방하여 비슷한 연구를 시작
5) 타인의 연구 결과를 무단으로 점자로 옮겨 적는 것
3.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투고하였을 경우에도 저자에게 그대로 유지되는 권리는?
1) 복제권
2) 전송권
3) 전시권
4) 편집권
5) 저작인격권
주관식 토론 문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경우 저작권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 문제에 관해 학술지와 연구자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논하시오.
참고문헌
1. 저작권법 대한민국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면개정
2.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Available from: 
.
Accessibility verified May 1, 2007.
3. 서달주. 한국저작권법. 박문각. 서울, 2007
4. 문화관광부. 저작권 바로알기 Available
from: http://www.mct.go.kr/open_content/copyright/ knowledge/ know01.htm
Accessibility verified 2006
5.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진흥재단 연구윤리소개 Available
from: http://www.krf.or.kr/KHPapp/database/database_03_view.jsp?sub=menu_06&bbs_seq=003&cu_idx=68&getP=1
Accessibility verified Feb 2006
표절과 올바른 인용 방법
Plagiarism
and appropriate citation
☞ 학습목표
표절의 개념을 이해하고 올바른 인용 방법을 비롯한 표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한다.
☞ 구체적 학습목표
1. 표절의 개념적 정의와 범위에 대해 설명한다.
2. 표절의 발견, 처리 절차, 사후 조치 등에 대해 설명한다.
3. 표절관련 여러 이슈에 대해 설명한다
4. 올바른 인용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5. 올바른 인용의 방법을 사용한다.
가. 서론
연구 윤리와 관련된 몇 가지 파문이 우리나라 학술계를 강타한 후 우리 학계에 대한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들 파문으로 논문 표절, 건수 부풀리기, 부적절한 저자 등에 관대했던 우리나라 연구 윤리의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시급히 연구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들 파문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것이 표절에 대한 것이다. 표절은 음악이나 미술 영역에서 자주 문제가 제기되어 매우 익숙한 용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나라 학술계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지는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표절을 연구 부정으로 간주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학생 때부터 표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직성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과학적 연구는 객관성, 정확성, 효율성, 정직성 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중 정직성은 출판 윤리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표절 정의나 판정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표절이 아주 경미한 인용상의 실수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적인 문제까지 매우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기준들이 세계화되면서 과거의 기준과는 다른 엄격성이 요청되고 있고 이는 많은 갈등 요소를 안고 있다. 그런 이유로 표절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의학 논문 윤리의 한 중요한 부분인 표절에 대해 용어, 정의과 범위, 표절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발견과 판정과 사후 처리 그리고 예방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한다.
나. 용어
표절을 의미하는 plagiarism의 어원은 ‘어린이 유괴’의 라틴어인 ‘plagiarius’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일반적이지만 그러한 견해가 잘못 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연구의 계획, 수행, 논문 작성, 출판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표절의 대상은 크게 아이디어와 본문으로 나눌 수 있다.
표절은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여 윤리적인 문제로만 취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연구 부정으로 간주되어서 처벌을 받기도 한다. 예들 들어 예들 들어 타인의 아이디어나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연구 부정(research misconduct)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잘못된 인용, 참고문헌 오류, 참고문헌 누락 등은 범죄 행위로 분류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verbatim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인용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따옴표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뜻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몇 단어를 바꾸거나 글의 순서를 바꾸어서 표현하는 경우를 바꿔 쓰기(paraphrasing)라고 한다. 바꿔 쓰기를 하더라도 참고한 문헌에 대한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래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의 문장을 약간의 표면적 변화만을 주고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면 적절한 인용을 하여도 표절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원래 문서에 있는 내용을 차용하여 사용할 때 바꿔 쓰기를 하려면 원래 문장의 내용의 아이디어와 용어를 완전히 이해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작성만 문서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줄여서 표현하는 것을 요약(summarizing)이라고 한다. 요약도 바뀌 쓰기와 거의 유사한 원칙이 적용되어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래 내용의 아이디어와 용어를 완전히 이해한 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여야 한다.
아이디어의 표절은 타인의 개념, 결론, 설명, 가설 등을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개인적인 교신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 이를 밝히는 것이 윤리적이다. 밝히는 방법은 각주가 될 수도 있고 인용이 될 수도 있고 내용 중에 표시할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이든 해당 아이디어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는 것이 현명하다. 이 경우는 윤리적인 문제만을 일으키고 대부분 의도하지 않은(unintentional)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이디어 표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 계획서를 심사할 때나 논문을 심사 할 때 다른 사람의 중요한 아이디어나 연구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를 인용하지 않고, 자신이 저자인 것처럼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행위 자체가 의도적이고 중대하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 부정을 간주한다.
다. 정의, 범위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COPE)는 표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다른 사람의 출판된 혹은 출판되지 않은 아이디어(연구 제안서 포함)를 인용 없이 사용하거나 새로운 저자로 논문을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표절은 연구의 계획, 연구 수행, 논문 쓰기, 출판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인쇄본, 전자 출판 모두에 해당되며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도 포함 된다”
의학잡지 편집인 국제 협의체(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서 제정한 생의학 잡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에서는 명백한 표절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관련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학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주요 정기간행물
(primary source periodicals)을 구독하는 독자는 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모두 처음으로 출판되는 원저라고 간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 저작권법 (international copyright law), 윤리적 진실성
(ethical conduct), 정보 자원의 효율성 (cost-effective use of resources) 등에 입각한 것이다.”
미국의 정부 기관인 연구 진실성 위원회(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는 표절을 “타인의 지적 자산을 도용 또는 착복(misappropriation)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의 본문을 복제하면서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 한다”. “지적 자산의 도용, 착복”이란 “연구비 심사나 논문 심사를 통해 알게 된 아이디어나 특정 방법론을 원저자의 허가 없이(unauthorized)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의 본문을 복제하면서 인용하지 않은 것”은 “문장이나 문단을 그대로 혹은 거의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용하지 않아 해당 사항에 대한 원저자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성 요한 대학교의 Roig는 ORI 프로젝트로 진행된 표절 관련 교육 프로그램 문서에서 표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1) 문서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쓰거나(verbatim), 일부 단어를 바꾸어서 사용하거나(paraphrasing), 일부 내용을 요약해서 사용할 수 때(summarizing)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기여를 완전히 밝히도록 하고, 2) 문서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쓸 때는 해당 부분은 따옴표로 표시하도록 하고 3) 문서의 일정 부분을 paraphrasing할 경우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여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며, 4) 기술하는 사실이나 아이디어가 주지하는 사실(common knowledge)인지 불확실할 경우에는 인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연구한 내용을 자신의 이름으로 논문을 출판하면서 연구 기여자의 이름을 저자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은 저자 분쟁(authorship
disputes)의 경우 ORI는 표절의 영역에서 제외하지만 국립과학 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같은 단체는 표절 영역에 포함 시킨다7).
중복게재(이중게재)의 경우 일종의 자기 표절로 보아 표절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 단체에서는 이중게재와 표절은 분리하여 취급한다.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지의 사실(common
knowledge)인 경우는 인용을 하지 않아도 표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지의 사실’인지의 여부는 예상되는 독자의 범위, 저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쓰고자 하는 내용이 주지의 사실인지 불확실할 경우에는 인용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콜로라도 대학의 방사선과 의사는 Armstrong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 한다.
“(1) 폐의 일차적인 기능은 흡입 가스와 정맥혈간의 가스 교환이다.
(2) 동맥 저산소증의 주요 원인은 환기와 관류의 불균형이다.
(3) 정상 성인의 폐에는 평균
300×106 개의 폐포가 있다”
이 경우 (1)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인용할 필요 없고 (3)은 반드시 인용하여야 하며 (2)의 경우 예상되는 독자의 범위, 저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7)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의견도 있다. 대부분의 잡지와 교과서는 지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용 가능한 것을 인용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용하는 것이 표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의 핵심이다. ICMJE의 통일 양식에도 이에 대한 구절이 있다5).
“해당
주제에 대하여 너무 상세하게 많은 문헌을 열거하면 인쇄본의 공간을 과다하게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은 문헌을 나열하기 보다 핵심이 되는
중요한 원전 문헌 몇
개를
열거하는 것이 좋다.”
표절은 한 언어로서 다른 언어로 표현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로 표현된 문서를 우리말로 번역할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표절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연구자가 영어로 된 논문을 작성할 경우 자신이 쓰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논문에서 일부 내용을 차용하는 경우도 표절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연구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제 3세계의 연구자들을 위해 이러한 원칙을 “faux
pas”(불어로 잘못된 방향이란 뜻으로 문화적인 이유로 잘못된 것으로 처리 되는 것을 말함)로 조금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매우 전문적인 내용 특히 매우 제한된 분야의 연구 방법론을 인용하면서 표절을 피하기 위해 일부 단어를 바꾸어 내용을 그대로 살리기는 매우 힘들다. 따라서 이전에 출판된 연구의 방법론 기술에 이용된 문장을 인용할 때는 표절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ORI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취한다.6)
“ORI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법론이나 과거 연구에서 기술된 연구 방법을 기술 하는 동일한 혹은 거의 동일한 문구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표절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ORI는 그렇게 하여도 독자들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윤리적인 저술 활동에 전적으로 부합되지는 않다는 비판도 있다. 즉 절을 줄이기 위한 원칙을 그대로 따라야 하며, 그대로 따올 경우에는 따옴표를 붙이고 일정 부분을
paraphrasing할 경우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여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도록 권장하기도 한다.7)
라. 표절과 저작권법
논문이 출판사에 투고되면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출판사로 이양되며 출판사는 논문이나 저작물을 출판, 재판 발행, 판매, 배포, 가공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만일 저작권이 있는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이 연구 나 교육 등의 “fair use”(정당한 사용)인 경우는 저작권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논문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용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반면 저작물의 표절이나 자기-표절은 일부 저작권법을 위해한 것이다. 이때 저작권에 대한 해석은 출판된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출판되지 않은 원고 예들 들어 연구 제안서 등도 저작권이 발효된 것으로 간주한다7).
적절한 인용과 따옴표 등의 사용으로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너무 많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저작권 법을 위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00-500단어 까지는 승인 없이 인용할 수 있지만 500단어가 넘어가면 이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다.
마. 발견, 판정, 사후관리
1) 발견
해당 학계에 내재하는 여러 가지 감시 시스템에 표절을 발견하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다. 논문을 읽는 독자나 논문의 투고를 받는 편집인, 논문을 심사하는 편집인 모두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 발견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부 소프트웨어는 전자 데이터베이스내의 동일한 어휘를 발견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문자가 30개 이상, 7-10개 단어, 48개 단어가 인용 부호 없이 동일할 경우를 보여준다. 이들 소프트웨어는 따옴표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verbatim)만을 골라내는 제한성이 있다. Google을 검색하는 것이 표절 여부를 선별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체계적 고찰 과정은 표절을 선별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체계적 고찰은 고찰하고자 하는 분야의 모든 논문을 검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표절이나 이중 게재 등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다. Charmers는 체계적 고찰 과정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을 발견하고 해당 저자의 많은 저작물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표절 내용을 알아낸 뒤 이를 수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과정을 BMJ에 발표하였다.
2) 판정
표절이 의심되면 해당 사례(allegation)가 표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표절의 심각성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표절에 대한 고발은 매우 심각한 것이고 만일 그러한 고발이 거짓으로 들어나거나 표절에 대한 가정이 잘못되었으면 이에 대한 반향을 무척 크기 때문에 판정에는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 상식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지만 논란이 되는 경우 법정에서 표절 여부가 가려지기도 한다.8)
대체로 표절 여부의 판정 주체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이며 해당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연구 윤리 관련 기구에서 시행을 한다.
표절의 심각도 혹은 정도(extent)를 다룰 때는 연구 부정을 다루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연구 부정은 해당 연구자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정직하고 책임성 있는 연구 행위에서 심각하게 벗어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시행되었거나(intentionally), 알면서 고의적으로 행하였거나(knowingly),
부정행위 여부에 개의치 않고(recklessly)
이루어졌을 때를 말한다.. 표절의 심각도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 1) 표절의 정도는 어떠한가, 2) 악의적인가?, 3) 과거에도 표절을 한 적이 있는가, 4) 저자의 위치는 어떠하고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가, 5) 표절을 한 저작물도 original한가? 와 같은 5가지 기준이 제안되기도 하였다.16)
미국의 경우 표절 등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과정은 아래와 같다.
“일련의 조사과정은 선의의 제보자가 (의혹이 제기된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진실성관리국에 의혹이 제기된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위반 가능성을 제보함으로서 시작되며, 그에 대해 연구진실성관리국이 연구기관에 통보, 연구기관은 자체 조사위원회를 가동하게 된다. 조사위원회의 결과는 연구진실성관리국에 통보되어 도출된 결과의 합리성에 대해 감독 및 평가가 이루어지며, 결론에 도달하였을 때 의혹이 제기된 연구자에게 최종 변론을 위한 항소의 권한이 주어진다.”
3) 사후관리, 예방
Charmer가 BMJ에 고발한 표절에 관련된 사항은 결국 해결되지 못하였다. charmer는 연구자가 속한 표절 논문을 출판한 잡지의 편집인, 세계보건기구(연구자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 연구자가 속한 대학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였지만 해당 기구는 만족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연구자는 그 후에도 왕성하게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결국 Charmers는 는 여러 연구 기관이나 잡지사는 표절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정책을 가져야 하며 표절 발견을 위해 체계적 고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5)
앞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상당수 기관에서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현재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이 문제이다.
바. 올바른 인용과 참고문헌 관련 윤리적 문제
1) 일반적 원칙
인용은 문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출처를 확인하게 해주며 인용에 쓰인 참고문헌은 문헌의 가장 후반부에 나열되어 있다. 참고문헌은 독자로 하여금 저자가 기술한 내용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와 근거를 찾아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정확도가 생명이다. 따라서 원고에 포함된 인용 내용과 참고문헌은 명백히 일치하여야 하며 참고문헌에는 인용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저자 이름, 잡지 이름, 권호 등의 정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그런 문제에는 윤리적으로 의문시되는 경우도 있고 부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Roig의 문헌을 기초로 정리하였다.6)
2) 윤리적으로 의문시 되는 경우
부주의하게 인용한 원천을 밝히는 것
학술적 혹은 과학적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참고문헌은 독자로 하여금 현재의 근거나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그런 이유로 저자는 논문에 참고문헌을 나열 할 때는 최대한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논문의 저저들이 항상 참고문헌 나열이나 논문 인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논문의 참고문헌에서 오류는 쉽게 발견할 수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
처음 발견한 사람을 인용하지 않는 것
또 다른 관심사 중의 하나는 처음 현상을 발견하고 연구한 사람을 적절히 인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상당수의 경우 최초의 발견자를 인용하기보다는 그 후에 이루어진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원칙은 처음 해당 사항을 발견한 사람과 논문을 인용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초 발견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참고문헌에 대한 부적절한 조작
일부 연구자들은 문헌을 검토할 때 공정하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가장 주요한 문제는 자신의 데이터나 이론에 적합한 문헌만을 인용하고 그렇지 않은 문헌들은 과감히 제외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책임성있는 연구를 하는 연구자라면 해당되는 모든 문헌을 인용하며 설사 자신의 이론이나 데이터에 반하는 문헌이라고 인용하여야 한다. 만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진실의 추구라는 연구자의 일차적인 목표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Citation
Stuffing
참고문헌에 대한 부적절한 조작으로 흔히 일어나는 것은 적절성에 관계없이 자신의 논문이나 자신과 관련성이 있는 잡지의 논문을 주로 인용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를 특히 citation stuffing이라고 한다. 이 경우 중요한 목적은 자신의 논문의 인용 지수(impact factor)를 높이는 것이다. 하는데 이는 과학의 객관성에 위배되는 행동일 수 있다.
인용지수는 각 논문들이 얼마나 인용되었는지를 측정하여 각 학술지의 중요도와 명성을 확인하는데 쓰인다. 하지만 개별 논문의 경우도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인용했는지를 따져서 각 개인의 이력이나 명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일부 연구자들은 자신의 논문을 적절성에 관계없이 논문에 끼워넣음으로써 이러한 인용지수를 높이려고 시도하게 된다.
비슷한 경우로 해당 논문의 심사를 담당하게될 가능성이 높은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자신의 논문을 인용한 논문에 대해 좀 더 호감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마직막으로 일부 학술지의 편집장들은 때때로 자신의 잡지의 인용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학술지의 논문을 더 많이 인용하도록 요청하기 한다(Manipulating
a Journal's Impact Factor). 저자들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저항하여야 한다.
초록이나 예비 논문을 인용하는 것
논문을 쓸 때 해당 주제에 대한 검색에서 자신의 논지를 펴는데 중요한 논문이지만 원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검색에서 볼 수 있는 초록만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참고문헌에 인용하여야 할까? 만일 인용한다면 초록을 참조하였음을 밝혀야 할까?
초록만을 보고 인용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초록은 논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게다가 초록은 매우 축약된 형태이므로 연구의 방법론이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다. 일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저자 이외의 사람이 논문의 초록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다. Uniform Requirements에서는 초록을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 한다5).
비슷한 경우로 출판된 형태의 논문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학술대회 발표용 초고이거나 학술대회 초록집에 수록되어 있는 예비 논문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인용하게 되면 학술 논문 작성의 필수적인 요소인 정직성과 정확성을 해치게 된다. 가장 큰 이유는 초고나 예비논문의 경우 실제 논문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심사 과정이나 학술대회 도중 지적을 받은 이후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출판된 이후에도 잘못된 부분이 수정된 오류 수정판이 나오기도 한다.
읽지 않은 논문이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논문을 인용하는 것
다른 논문에 인용되어 있는 참고문헌을 실제 논문을 보지 않고 인용하는 것(이차 인용 : secondary citation)은 올바르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표절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는 인용한 다른 논문이 부정확할 수 있고 독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만일 다른 사람이 인용한 논문을 확인하기 힘든 경우는 그런 사실을 밝히면 된다7).
blanket reference
“blanket reference”는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 논문을 동시에 인용하는 것이다. blanket reference의 예는 “최근 몇 년간 의학문헌에서 표절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1-5”와 같은 것이다8). blanket reference에 속한 모든 참고문헌의 내용이 적절히 요약된 것이라면 문제는 없지만 개발 저작물의 기여 정도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고 인용 오류가 은폐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 결론
일반적으로 과학 연구에는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객관성 등의 덕목이 요청된다. 이중 정확성, 효율성, 객관성 등은 대부분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정직성을 위반하는 행위는 대부분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며 가장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표절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남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자신의 창작물로 위장함으로써 연구의 주요 덕목인 정직성(integrity)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절 문제는 작년 몇몇 연구 윤리관련 파문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다. 하지만 그 경우 해당 연구자의 지위의 박탈로 모든 사안은 종결되었으며 해당 논문의 표절 여부는 명백히 판정이 나지 않았고 지위 박탈 이후 어떠한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서양의 경우도 표절이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연구 윤리의 문제였지만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체계적 대책을 세운 것은 불과 20년 정도이다. 체계적인 대책이란 연구 윤리 기준의 마련, 연구 부정에 대한 정의, 처리 절차 마련,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전담기구의 마련 등이다.
향후 출판 윤리의 문제와 연구 부정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을 때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아. 이해를 위한 문제
객관식 문제
1. 표절의 정의로 가장 합당한 것은?
1)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타인의 연구내용 및 결과, 아이디어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3) 연구재료, 장비, 과정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4) 동일한 원고를 한 잡지에서 게재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다른 잡지에 투고하는 것
5) 논문을 여러 개로 나누어 출판하는 것
2. 다음 중 명백한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 폐의 일차적인 기능은 흡입 가스와 정맥혈간의 가스 교환이다.
2) 동맥 저산소증의 주요 원인은 환기와 관류의 불균형이다.
3) 정상 성인의 폐에는 평균 300×106
개의 폐포가 있다
4)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다
5) 폐포는 하루에 100개씩 없어지고 새로 생겨난다.
3. 다음과 같은 인용행태를 무엇이라고 할까?
|
참고문헌에 대한
부적절한 조작으로
흔히 일어나는
것은 적절성에
관계없이 자신의
논문이나 자신과
관련성이 있는
잡지의 논문을
주로 인용하는
경우이다.
|
1) blanket
reference
2) Citation Stuffing
3) Manipulating a Journal's Impact
Factor
4) secondary
citation
5) blanket
reference
4.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글씨기 표절에 대해는 매우 관대한 편이며 특히 학생들의 표절은 문제가 많이 된다.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5. 참고문헌 인용은 매우 엄격해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가?
참고문헌
저자됨
Authorship
☞ 학습목표
저작물의 저자가 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저자 자격 원칙이나 순서 등이 윤리적인 기준에 맞도록 노력한다.
☞ 구체적 학습목표
1. 저작물에서 저자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한다.
2. 저자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한다.
3. 저자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한다.
4. 명예저자, 유령 저자에 대해서 설명한다.
5. 저자 관련 윤리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연구 결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료 연구자들이나 대중들에게 공유되며 이러한 공유를 통해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 진다. 초기 연구 결과는 연구 회의, 세미나, 전문가 회의 등에서 발표되고 최종 연구 결과는 학술지에 논문 혹은 저서를 통해 발표하게 된다. 일반인들에게는 보도자료나 인터뷰 등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는 행태를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달에는 만족시켜야 하는 몇 가지 최소 기준이 있다. 그러한 기준은 자신이 한 작업에 대해서 완전하고도 공정하게 기술하는 것,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 발견한 사항에 대해 정직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평가하는 것이다.
생의학 출판물에서 저자는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 누구이고 누가 공적을 인정받을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뜻이 있다. 누구나 연구의 방법이나 결과, 결과 해석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연구를 진행했는지를 밝히고 누구에게 그러한 의문을 해결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연구자들은 결국 논문의 질과 양으로 평가받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연구를 책임졌던 사람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저자로 명기해야 한다.
연구 윤리와 관련해서 저자와 관련된 문제는 아래와 같다.
1) 저자의 자격은 어떠한가?
2) 저자의 순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3) 학생이나 멘티도 저자가 될 수 있는가?
4) 저자와 관련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가?
가. 저자의 자격
저자의 자격은 물론 연구에 중요한(significant)
공헌을 한 사람이다. 이러한 중요한 기여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거론된다.
1) 연구의 개념과 설계에 참여
2) 데이터 수집과 해석을 책임을 짐
3) 발표 초안 작성에 참여
4) 발표 최종본을 승인
저자의 자격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아들 모든 경우를 다 만족해야만 저자의 자격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일부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저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의학 잡지 편집인 국제 협의체(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서 제정한 생의학 잡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에서는 저자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저자란 출판된 논문에 지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을 일컬으며 생의학 논문의 저자는 학술적, 사회적, 재정적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독자는 지금까지 저자가 논문에 기재된 저자나 기여자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현재 몇몇 학술지가 적어도 원저에 대하여 논문에 포함된 저자나 기여자의 역할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실제로 그 내용을 학술지에 발표하기도 한다. 우리 위원회는 편집인이 학술지 별로 전체 논문을 작성하는데 참여하고 책임지는 저자와 도움을 준 기여자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강력하게 권장한다.
기여자와 재정지원자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기여나 다른 연구지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모호한 부분을 분명하게 한다. 그러나 저자됨에 필요한 기여의 여러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는 못한다.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저자됨에 필요한 기준을 권장한다. 이 기준은 저자와 기여자를 구별하는 학술지에게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다.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1)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2)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3)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한다.”
즉 ICMJE의 정의는 모든 부분을 다 만족해야만 저자로서 자격을 부여하며 만일 일부분만을 만족하는 경우는 저자보다는 기여자로 감사의 글에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자 정의가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Office for
Research Integrity에서 발행한 ‘연구 윤리 소개’라는 책에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논평이 있다1).
“ ICMJE에서 제정한
<생의학 잡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은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엄격한 저자의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자격에 대한 ICMJE의 권고 사항이 영향력이 있기는 해도, 연구자들이 그것을 일률적으로 따르고 있지 않다. ICMJE의 요구사항을 맞추어야 하는 학술지조차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저자 결정 관행은 연구 분야별, 연구 기관별 제각각이다. 그러므로 저자 자격 결정의 책임은 대부분 연구자들에게 있으며 그러한 결정은 프로젝트 초기에 이루어져 저작권에 대한 오해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COPE)는 저자 문제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즉 COPE는 저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현재 여러 가지 시도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자에 대한 모두가 동의할만한 정의는 아직 없다. 최소한 저자들은 연구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COPE는 저자 자격의 부여는 개념화, 연구 디자인, 분석, 논문 작성 등에 대한 균형 잡힌 지적 기여에 따라 하여야 하며 자료 수집이나 기타 관례적 작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특정 개인이 합리적으로 기여한바가 없다고 하면 저자로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3)
저자의 자격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학생, 연구원과 같이 멘토(Mentor)와 훈련생(trainee)에 대한 부분이다.
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지도 교수의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생 혹은 훈련생이라고 해서 저자의 원칙이 바뀐다고 보지는 않는다. 즉 훈련생이 논문 작성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했으면 저자로서 당연히 저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연구에 기여하였지만 부분적이어서 저자로 인정받지 못한 연구자를 기여자라고 하며 이들은 감사의 글에 언급된다. 이에 대한 ICAMJE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2)
“저자됨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연구와 논문발표에 기여한 사람들의 이름은 감사문에 기여자로 기재한다. 이 난에 기재되는 사람은 연구수행에 기술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논문 작성에 기여하였거나 총괄적인 지원을 한 부서의 일원 등이다. 편집인은 언제든지 저자에게 논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한 사람의 신원을 밝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논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었거나 연구재료를 제공하였지만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여자는 “임상 조사자
clinical investigators” 혹은 “참여 조사자 participating investigators”의 명칭으로 그 이름을 기재하며, 그들의 기여 내용은 예를 들어,
'과학자문(scientific advisors), 정밀하게 검토(critically reviewed the study proposal), 자료를 수집(collected
data), 대상 환자의 치료 및 자료제공(provided
and cared for study patients)' 등으로 적는 것이 합당하다. 독자들이 논문의 내용과 결론을 신뢰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기여자는 논문의 감사문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작성한다.”
저자의 자격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연구 기획 단계에 누구를 저자로 하고 누구를 기여자로 하고 누구를 감사에 글에 실을 지에 대해서 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3)
나. 저자 관련 이슈
1) 저자의 순서
저자들은 중요도 순으로 이름이 기재되며 가장 기여도가 높은 사람은 첫 번째 혹은 마지막에 실린다. 물론 연구 분야별로 관행이 다를 수 있으나 상당수 기관은 논문의 첫 번째 혹은 마지막 저자가 된 논문이 발행되지 않으면 종신 교수 자격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기여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누가 제 1저자로 실린 것인가 혹은 이름은 어떤 순서로 표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규정은 없다. 국제 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의 요청은 아래와 같다.2)
“저자 이름순서는 공동저자들이 함께 결정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저자의 순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저자표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는 그에 따라서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순서를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다.
2) 제1 저자, 교신저자, senior author
일반적으로 제 1 저자는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으로 결정되지만 이들이 항상 교신 혹은 책임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잡지에서는 교신저자 혹은 저자를 정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이들은 논문에 대해서 1)데이터의 정확성, 2) 저자 자격, 3) 모든 저자들이 최종안에 대한 승인하는 것, 3) 교신과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것 등을 책임진다.
현재 몇몇 학술지는 이 연구 시작부터 논문이 출판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책임을 지는 한 명 혹은 복수의 책임저자(guarantor)를 지정하기를 요구한다.
과거에는 연구의 책임자나 해당 부서의 부서장을 저자 중 가장 나중에 실고 senior author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데이터베이스에 색인되는 저자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은 단어이다.
3) 연구그룹 문제
다기관임상시험의 저자가 점점 단체명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여러 곳의 연구실에서 많은 인원이 단체로 참가한 연구도 있다. 이 경우 저자로 단체 이름과 저자 이름을 같이 나열하기도 하고 단체 이름만을 저자 이름에 넣고 저자와 기여자는 논문의 가장 마지막에 제시하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이든 논문에 저자로 참가하는 사람은 자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편집인은 참가하는 저자 개개인에게 저자로서의 역할과 이해관계 공지문을 작성할 수 도 있다. 이 경우 책임저자는 문헌으로 어떻게 인용되는 것을 원하는지 (preferred
citation) 명확히 기술하고 인용을 원하는 단체의 이름 또는 저자명을 모두 밝혀야 한다.2)
다. 저자 관련 연구 윤리
1) 명예저자
논문 저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저자로 올리는 관행이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실제로 심각한 문제이다. 연구자들은 1) 연구 시행의 총책임자 혹은 해당 부서의 책임자, 2) 연구 지원금을 제공, 3) 해당 분야의 선도적 연구자라는 이유 4) 주요 저자의 멘토라는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논문에 큰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여가 이것뿐이라면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4).
2) 유령 저자
유령 저자는 저작물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이 저자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외국의 경우 대체로 제약 산업이나 기기 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이러한 유령 저자 행위는 일부 예외(예 : 연설문 작성자)를 제외하고는 비윤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기여한 사람에 대해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는 다른 사람이 대신 숙제나 논문을 써 주는 것이 유령 저자의 문제일 수 있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는 이미 쓰인 논문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며 심지어 학위 논문 등을 몇몇 템플릿을 만들어서 개인에 맞게 제조해주는 서비스까지 생겨났다. 이런 관행은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보편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성행하던 관행이다.4)
실제 문학에서 유령 저자는 유명인의 전기나 저서를 대행해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다. 이 경우 독자는 유명인이 전체적인 책을 모두 집필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의학 학술지에서는 유령저자 문제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 대표적인 관행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제조 회사에서 특정 분야 전문가를 내세워 특정 약물이나 기기에 대한 종설 논문을 쓰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유령 저자가 미리 저술한 내용의 초안을 건네어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 해당 회사의 제품이 실제 보다 부풀려지거나 더 많이 다루어진 내용이 들어가 있다. 혹은 Sponsor-initiated trial의 경우 비슷한 형태로 외부 저자를 고용하여 회사의 이해관계 문제를 피해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시고 한다.
이에 대해 COPE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3)
“만일 직업적인 논문 작성자가 제약회사, 의료 기구 등에 취업해서 논문을 쓴다면 그 사람의 이름도 포함이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의 문제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유령 저자 문제는 얼마나 흔할까? JAMA에는 유령저자 문제가 얼마나 흔할 것인가에 대해서 1998년, 2002년 두 차례 논문을 게재하였다. 1998년 논문에서 6개 잡지의 저자 809명에게 조사를 하였을 때 명예저자와 유령 저자는 각각 19%와 11%였다. 2002년에는 Cochrane review 저자들에게 문의하였을 때 명예저자와 유령저자는 각각 39%, 9%였다.
라. 해결 방법
잡지가 저자의 기여도를 밝히는 정책이 저자 문제의 해결이 될 수도 있다. Bates 등은 BMJ, JAMA, Annals of intern Medicine의 저자 기여도 공개 정책을 비교하고 이러한 정책에 따라 잘못된 저자 자격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에 따르면 BMJ는 기여도를 저자 나름대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Annals는 기여에 대한 리스트를 나열하고 이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JAMA는 ICMJE authorship criteria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세 잡지 중 명예저자 비율은 Annals(121.5%), BMJ(9.5%), JAMA(0.5%)의 순서였다고 하였다.
저자는 자신의 이름이 여러 가지 저작물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처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저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확실하지 않으면 해당 잡지의 투고규정을 잘 참조하여야 한다.
마. 이해를 위한 문제풀이
객관식 문제
1. 저자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은?
1) 저자들이 순서를 결정하지만 순선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함.
2) 대체로 논문작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을 제 1저자로 한다.
3) 연구 감독자는 제 2 저자로 한다.
4) 7인 이상인 경우 인용이 6인까지 되므로 교신저자는 제 1 혹은 제 2저자가 된다.
5) 교신저자는 저자사이의 협의로 결정한다.
2. 저자가 되기에 적합한 경우는?
1) 논문작성에 필요한 연구비를 수령하고, 논문 작성과 수정에 참여하지 못한 교원
2) 환자 증례를 공유할 수 있게 허락한 다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논문 작성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3) 연구를 실험실에서 진행하고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고, 논문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4) 연구 계획에 참여하고 논문작성에서 고찰 부분을 담당하였고 투고 후 심의 받고 최종 논문 투고를 확인하지 못한 전공의
5) 자료를 분석하고, 논문을 직접 작성하고 최종 투고 원고를 검토한 전공의
3. 논문대행 사이트를 이용해서 논문을 작성한 경우 저자 관련 윤리적 문제는?
1) 유령저자
2) 명예저자
3) 저자 교환(swap
author)
4) 기여자 문제
5) 훈련생 문제
주관식 문제
저자 분쟁 관련 윤리적 문제는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국과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토론해 본다.
참고문헌
이중 게재
duplicate
publication
☞ 학습목표
이중게재의 정의와 유형을 이해하고 이중게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 구체적 학습목표
1. 이중게재의 정의와 유형에 대하여 이해한다
2. 이중게재의 현황의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3. 이중게재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4. 이중게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최근 몇 가지 계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이중 게재가 문제가 되었다.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이러한 이중 게재를 출판 윤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 엄격히 금지하여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중 게재가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자각이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학편집인 협의회에서 코리아메드라는 영문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중복게재에 대한 문제가 불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 문제는 매우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중 게재의 개념이나 실태, 유형, 처리 방법 등에서 논란이 있으며 이중 게재가 발견되었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이에 지금까지의 문헌을 참조하여 이중 게재의 개념, 실태, 유형, 처리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학 잡지 편집인 국제 협의체(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서 제정한 생의학 잡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에 따라 잡지를 출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통일 양식 최근호에서 이중 게재에 대한 부분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1) 용어
이중 게재(duplication
publication),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ICMJE에서도 둘 사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문헌에서는 중복게재와 이중 게재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중복게재는 이미 출판된 자료에 다른 자료를 추가하는 것을, 이중 게재는 기존 논문과 동일하거나 겹치는 문헌을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구분할 경우 이중 게재는 중복게재의 한 아형이 된다. 미국 생리학회에서 출판 윤리 위반 사례를 수집할 때 이중 게재와 중복게재를 구분한다2).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유사한 것으로 분절출판(salami
publication)이란 것이 있다. 특정 질환의 방사선학적인 측면을 방사선 학회에 투고하고 신경외과적 측면을 신경외과 잡지에 투고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물론 대규모 임상 혹은 역학 연구로 명백히 여러 질문을 가지고 있어서 한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이 힘든 경우는 분절 출판이라고 하지 않는다. 비교적 적은규모의 연구에서 연구 결과가 겹친다면 이 논문을 하나로 합쳐서 좀 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분절 출판도 연구 결과와 대상, 결론 등이 상당히 겹치므로 이중 게재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2) 개념, 유형
이중 게재란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부분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1)'여기서 말하는 ‘상당 부분'이라는 단어가 애매하기 때문에 몇몇 잡지에서는 이에 대해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예들 들어 심장수술에 대한 6개 편집장이 모여서 결정한 중복(이중)출판의 정의는 1) 가설이 유사, 2) 표본 수가 유사, 3) 방법이 유사하거나 동일, 4) 결과가 유사, 5) 최소한 1명의 저자는 동일, 6)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음의 6가지이다 이중 게재란 결국 이상의 원고가 저자, 자료원을 공유하고 1) 원고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이거나 2) 두 원고를 쉽게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중 게재 문제의 핵심은 중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복은 저자, 자료원, 연구 질문 등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허용될 수 있는 중복의 범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만일 저자가 동일한 자료 원에서 둘 이상의 논문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저자는 그런 사실을 편집인에게 모두 알리고 일정 정도 중복이 있는 논문 모두와 출판된 논문 모두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모두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에서는 중복게재를 둘 이상의 출판물이 완전한 인용 처리 없이 가설, 자료, 토론, 논점, 결론 등을 공유한 경우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동일 자료원”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예들 들어 국가 주요 통계를 이용해서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기간 자료에 대해서 같은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한 자료이지만 자료원이 같고 분석이 같아서 이중게재다. 반면에 만일 저자가 같은 기간 지료를 이용해서 남자에 대한 분석으로 한 논문을 쓰고 여성에 대한 분석으로 또 다른 논문을 쓴다면 이것은 이중 게재가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잡지에서는 이 두 원고를 하나의 논문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할 것이다.
출판한 이후에 다른 언어로 출판하거나 전혀 다른 독자를 위해서 여러 논문을 출판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원 논문에 대해서 완전하게 밝히고 인용하여야 한다.
의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논문이 완성되기 이전에 대중매체에 연구 결과가 미리 발표되기도 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논문 출판 전에 학술대회에 발표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체 결과를 표로 제시하거나 논문에 대한 해석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아야 한다.
이중 게재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Elm 등은 56개 체계적 고찰에 실린 논문 1131개 논문 중 이중 게재로 밝혀진 103개 논문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다고 발표하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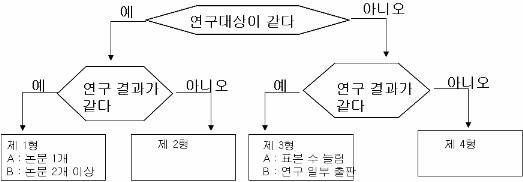
첫째는 두 논문 간에 표본과 같고 결과(outcome)도 같은 것이다. 이것은 복제(copy)라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완전히 동일한 논문을 다른 논문으로 투고하는 것이다(제 1형A). 이와는 비슷하지만 두 개 이상의 논문을 짜깁기 하여 다른 하나의 논문을 완성하는 경우가 있다(제 1형B). 이런 형태는 대부분 제약회사가 후원하는 논문인 경우가 많으며 부록(supplement) 형태로 출판되는 경우가 많다. 저자가 바뀌기 때문에 상호 심사를 통해 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부록형태로 출판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표본은 같지만 다른 결과에 대해 논문을 쓰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특히 자료의 분절(fragmentation)이 문제가 된다. 저자는 제약회사가 아닌 단체에서 스폰서를 받은 경우가 많고 참고문헌 처리를 불명확하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공 펀드를 받은 연구자의 경우 연구비 지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논문을 발표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제 2형).
셋째는 연구 대상자를 늘리거나 줄여서 논문을 쓰는 형태이다. 우선 표본수를 늘려서 발표하는 경우는 대부분 예비 논문에 자료를 더 추가하여 완전한 논문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논문은 Impact factor가 매우 높은 잡지에 실리고 높은 인용률을 보인다(제 3형A). 비슷한 형태지만 이미 발표된 논문 중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 같은 분석을 하여 논문을 쓰는 경우가 있다. 이를 특히 분해(desegregation)라고 부른다(제 3형B).
넷째는 표본이 다르고 결과가 다른 것이다. 이것은 가장 복잡한 형태로 저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3) 실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중 게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된 적은 없었다. 외국에서도 일부 잡지를 대상으로 이중 게재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조사된 적은 거의 않다.
Archives of Otolaryngology - Head and
Neck Surgery의 편집장인 Byron Bailey는 해당 잡지에서 무작위로 1000명을 뽑아서 조사하였을 때 644건이 이중 게재물일 수 있다고 하였다.
수술 후 제토제로 쓰이는 ondansetron에 대한 무작위 임상 시험을 조사한 결과 출판된 무작위 연구 중 17%는 이중 게재된 것이었다. 네덜란드 잡지 Nederlands Tijdschrift voor Geneeskunde에 1992년 전반기에 실린 논문 76편 중에서 12편은 과거에 출판된 것이었으며 이중 5편은 이에 대한 고지를 하였고 7편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일부 간호학 잡지에 대한 연구에서 원저 중 28%는 실제로 이중 개제였으며 이중 1/3은 원 논문에 대해 참고문헌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Elm 등은 56개 체계적 고찰에 실린 논문 1131개 논문 중 총 103개가 이중 게재 때문에 제외되었다고 하였다(9.1%). 이중 60개는 두 번 출판되었고 13개는 세 번, 3개는 네 번, 2개는 5번 출판되었다고 하였다. 첫 출판과 이중 게재물 사이의 간격은 평균 1년(0-7년)이라고 하였다.
여러 연구자들이 이중 게재를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체계적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다만 논문의 수로 연구자의 업적을 평가하는 현재의 풍토, 출판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분위기(“publish or
perish”), 이중 게재에 대한 무지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4) 중복게재가 허용되는 경우
중복게재라고 해도 두 잡지의 편집인이 허용하고 중복게재임을 명백히 밝히면 허용된다.
ICJME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복게재를 허용한다.
1. 저자는 두 잡지 편집인 모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차 출판 원고를 받은 편집인은 일차 출판물의 복사본이나 재인쇄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일차 출판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출판 간격을 둔다(두 편집인들이 협상한 경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3. 이차 출판 논문은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 축약본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4. 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논문의 자료와 해석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5. 표지에 각주를 통해서 독자, 심사자, 사무국에 현 원고 전체 혹은 부분이 다른 잡지에 출판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적절한 각주는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잡지이름, 전체 참고문헌]에 처음 보고된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이차 출판을 허용 할 때는 무료로 하여야 한다.
6. 이차 출판물의 제목에는 이것이 이차 출판임을 표현하는 문구(재출판, 요약 재출판, 완역, 요약 번역)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학도서관에서는 번역을 “재출판”으로 간주하지 않고 원저가 출판되어 있고 메드라인에 색인되어 있으면 번역본은 색인하거나 인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COPE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한다.
1) 출판된 논문은 추가적으로 확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복 출판할 필요가 없다
2) 학술대회를 통해 기존에 출판되었다고 해서 출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완전한 공개는 출판당시에 하도록 한다.
3) 다른 언어로 출판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논문 투고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4) 논문 투고 당시 저자는 모든 관계 문헌(다른 언어로 된 것, 출판 중인 것 모두 포함)을 밝혀야 한다.
5) 이중 게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중 게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윤리적이기 때문이다
첫째, 여러 가지 자원을 낭비한다. 하나의 논문이면 족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만들면 잡지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나고 결국 여러 가지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잡지를 출판하기 위해서는 편집자, 심사자가 필요 없는 노력을 다시 기울여야 하고 논문 출판 이후에는 색인자가 다시 논문을 색인하여야 하며 검색자는 같은 논문을 두 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자원이 낭비가 초래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 때문에 원래 출판되어져야할 다른 논문들의 출판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이다. 자원 낭비에는 의료 정보의 적재 증가도 포함된다. 2006년 현재 PubMed에 색인된 논문의 수가 1400만 건이라고 하고 이중 약 10%만 이중 게재라고 해도 140만 건은 쓸모없이 의료 정보의 과적 현상만 증가시킬 따름이다.
둘째, 결과를 과대평가하게 된다. 동일 자료가 두 번 카운트되면 전체적인 근거 정도를 평가할 때도 두 번 산정 되는 문제가 있다. 최근 근거 중심의학에서 메타분석의 결과가 중요해지면서 이러한 측면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이중 게재는 실제 메타 분석 결과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Tramer
등은 수술 후 제토제로 쓰이는 ondansetron의 효과를 보기 위한 무작위 대조 연구를 분석하였을 때 전체 논문 중 17% 이중 게재물이었으며 전체 환자 중 28%는 중복 산정되었다. 또한 중복게재에 대한 고려 없이 분석하면 약제 효과를 23% 과대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11) 이는 약제 안전성이나 효과 비뚤림의 주요 요인일 수 있다. 메타 분석 수행 중 이중 게재 여부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실제 논문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이중 게재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다. 각 논문은 출판되는 순간 저작권은 출판사가 가지며 만일 저자가 이를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하면 이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6) 이중게재 판정과 사후 조치
이중 투고 혹은 출판이 의심되면 대부분 원 논문의 잡지에도 신속히 알리고 두 원고 모두를 독립적인 심사자에게 보내서 중복의 가능성과 정도를 판정하게 된다. 두 논문의 저자에게도 해당 사안이 발생했음을 알리고 해명 자료를 받는다.
ICMJE는 이중 투고 혹은 이중 게재에 대해서 몇 가지 권고를 하고 있다. 즉 최소한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게제 불가 판정을 내리고 출판된 논문에 대해서는 중복 출판에 대한 공지를(저자의 설명이나 시인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출판하도록 하고 있다1). 잡지사 혹은 저자에 의해 논문 자체를 철회시키는 경우도 있다(retraction of publication). 현재 PubMed에서 “retracted publication[pt] AND
duplicate publication[pt]로 검색하면 총 7편이, “duplicate publication[pt]”로 617편, “retracted publication”으로 686편이 검색된다, Notice of Duplicate publication은 PubMed에 인용되기 때문에 저자의 명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현재 총 62편). 잡지 편집인은 다른 잡지에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저자가 속한 기관의 책임자에게 이를 공지하기도 한다. 일정 기간 잡지 출판 금지 등의 처벌을 내리기도 한다. 두 잡지의 편집은 연합해서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를 공적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각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일부경우에 저자는 국제 저작권법 위반 때문에 법정에 서기도 한다3).
7)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이중 게재는 중대한 문제이며 출판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중 게재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행위이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연구자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명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가. 이해를 위한 문제
1)객관식 문제
1. 다음 중 이중게재가 허용되는 경우는?
1) 언어를 다르게 해서 게재할 경우
2) 두개 이상의 원고가 저자, 자료원을 공유할 경우
3) 특정 질환의 방사선학적 측면을 방사선학회에 투고하고, 신경외과적 측면을 신경외과 잡지에 투고
4) 학위논문이나 표나 전체 해석이 공개되지 않은 학술대회 초록
5) 이미 발표한 자료에 자료를 다시 추가하고 같은 결과를 다시 출판하는 경우
2. 연구대상이 다르지만 연구 결과가 같을 때 이중출판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1) copy publication
2) salami
publication
3) fragmentation
publication
4) imalas
publication
3. 이중게제 등의 논문을 발견 했을 경우 사후처리방법 중 틀린 것은?
1) 원 논문의 잡지에게 알림
2) 독립적인 평가 없이 의심될 경우 즉시 소속 책임자에게 공지한다.
3) 저자에게 해명 자료를 받음
4) 일정기간 잡지 출판을 금지한다.
5) PubMed에서 retraction처리를 한다.
2)주관식 토론 문제
1. 이중게재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으로 들은 적이 있었는지? 그 당시 윤리 원칙에 맞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는지
2. 이중게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참고문헌
출판 관련 윤리
Publication
Ethics
☞ 학습 목표
자료 관리, 상호 심의 등 출판 전후 과정에서 윤리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 구체 목표
1) 실험실에서 지도교수와 학생의 책임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2) 실험 자료의 관리에서 주의할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료의 인용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논문 투고자, 심사자 및 편집인의 역할 및 부정행위 예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5) 자료 및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6) 학술지 논문의 출판 윤리에 저촉되어 출판을 취소할 때의 절차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머리말
의과대학 또는 대학병원에서 상황은 조금 다르나, 연구의 감독은 주로 교원이 그리고 실행은 주로 대학원생, 전공의, 전임의 또는 젊은 교원이 다룬다. 기초에서는 우리나라도 과거와 다르게 미국식이 되어 한 교실에서도 교원마다 독자적인 일을 하고 각각 연구책임자로서 조교, 연구원, 대학원생 또는 포닥과 같이 일을 하고 다른 교원의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즉, 업적도 교원 개인의 것이지 교실 전체 교원의 업적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조금 다르게 아직도 주임교수 또는 과장의 감독권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험 또는 임상 자료의 관리, 논문 투고 및 심의 과정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저자되기에 대한 고려 역시 다르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여 투고하고 심의 받고 출판하기 과정에 벌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를 점검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비록 드물지만 이중게재, 원자료 해석의 오류, 동일 실험의 반복 입증 실패, 또는 날조, 변조, 조작 등의 경우에 학술지에서 논문을 취소하는 절차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이런 전 과정에서 앞으로 연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하여 보려고 한다. 이 단원에서는 주로 임상 현장에서 전공의나 전임의와 같은 훈련생과 지도교수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기술하려고 한다. 이 글의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공동 발행한 ‘연구윤리소개’에서 제시한 목차를 줄기로 우리나라 연구 및 출판 상황에 맞게 수정 편집한 것이다1).
지도자와 훈련생의 책임
인턴을 마치고 전공의가 되면, 일 년차 때는 환자 보는 데 열심이고, 다른 데 신경을 쏟을 겨를 없이 바쁘게 지나가기 마련이다. 이 때 대학원을 다니면서 여러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할 수도 있으나, 일 년차 때는 연구에 참여한다고 하여도 자료 수집이나, 정리 수준인 경우가 많다. 이년차 때부터는 본격적인 연구에 참여하여 논문 작성을 시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는 여러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전공의 과정 중에 일정 수의 논문을 특정 또는 불특정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전문의시험을 치를 자격을 주는 과가 많다. 그런 경우, 전공의는 반드시 학술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실험을 하거나 임상자료를 모아서 정리, 분석하여 새로운 지견을 창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개는 지도자가 어떤 계획을 하여 실행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큰 윤곽만 주고 공부하여 어떤 내용이 적당할지 스스로 찾아서 연구하도록 하거나 하는 등 주어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학병원 단위에서 별도의 실험실이 있어서 병원에서 나온 검체를 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동물 실험을 할 수 있으면 매우 다행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도자가 특별히 외부 연구비가 없을 수도 있고 또한 별도의 실험실을 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기초나 외부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곳과 공동으로 실험을 할 수도 있다. 이 때 지도자는 연구자로서의 역할 모형을 할 수 있어야 훈련생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기에 연구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지도자가 만일 자료 조작이나 변조 또는 날조를 지시하거나 이중게재를 지시한다면 훈련생은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으레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기본 연구 출판 윤리 뿐 아니라 또한 훈련생에게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도자가 직접 지도할 수 있으면 정기적인 훈련을 통하여 또는 같이 실험을 하거나 자료를 분석하면서 지도할 수 있다. 지도자가 연구의 모든 분야를 직접 지도하기 어려우면 연구방법론에 대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훈련생이 배우도록 할 수 있다. 연구에서 통계 처리나, 역학 자료 분석, 코호트 연구, 실험동물 방법론 등과 같은 것은 개개의 실험 방법이외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므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훈련시킨다면 그 효율이 매우 높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구출판윤리도 대학원 과정 또는 전공의 훈련과정에 넣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국영문 논문 작성법, 참고 문헌 인용법 등 다양한 과정을 개발하여 훈련을 시키면 훈련생은 조금도 자신감을 가지고 연구 및 논문 작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공의 훈련 과정은 대학병원의 수련 질 평가와 연관되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런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더불어 훈련생이 제대로 일을 진행하는 지 실험 노트와 자료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만나 진척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대개 일주일에 한번은 모임을 갖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임상 현장에서 이렇게 시간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여야 서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다. 이런 지도자의 태도가 앞으로 훈련생의 연구 자세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독립적인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런 여러 과정에서 지도자와 훈련생 사이의 rapport 형성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어느 일이 지도자나 훈련생이 모두 또는 한쪽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런 rapport 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힘을 합쳐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단순히 일시적인 관계에 끝나서 오랜 기간 같이 일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훈련과정을 마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rapport임은 어느 사회나 조직과 같다. 의사 사회는 워낙 뛰어난 사람이 많이 활동하기에, 개중에는 자신만이 제일 뛰어나고 다른 사람 의견은 거의 듣지 않는 독불장군이 있을 수 있어서, 주위의 사람이 괴로울 뿐 아니라 이런 경우 훈련생과의 rapport는 형성하기 어렵다.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남성 지도자와 여성 훈련생 사이 불평등으로 인한 성폭력 문제이다. 비록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쳐서 그렇기는 하지만, 지도자에 의한 여성 훈련생에 대한 성폭력은 범죄행위이다. 지도자가 술집 또는 어떤 상황에서 여성훈련생에 대한 성적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꼭 신문 방송에 실린 것만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 실제 일어나고 있고 또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형사 처분과 교직에서 파면이 종착역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훈련생은 자기 밑에서 자신의 연구비로 또는 자신에게 배워야 하는 자신의 부하가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서 단지 지도자-훈련생 이라는 관계에 따라 같이 일하고 rapport 형성을 잘하여 두고두고 같은 길을 가야 하는 동업자라는 인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
훈련생은 연구 과정에서 지도자의 감독아래 연구를 수행할 책임이 있고, 자료의 조작이나 변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전공의 시험을 위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실험 결과가 좋지 않다고 조작을 하게 되면 지도자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정정할 방법이 없다. 이런 예는 이미 방송을 통하여 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 적도 있다. 또한 논문 출판에서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그 논문에 대하여는 평생 책임을 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료의 관리
실험실이나 환자 자료 분석에서 나오는 자료는 그 연구실의 고유의 재산이고 또한 소속 기관의 재산이므로 그 관리에 신중하여야 한다. 과연 연구를 마치기 전에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고 연구물을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특허를 받은 뒤에는 어떻게 관리하여야 할까?
우선 실험실 자료는 고유의 자산이므로 임으로 외부에 누출하면 안 된다.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누구도 연구 책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료를 외부에 보내면 안 된다. 그것은 실험 전의 재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미생물이나 기생충과 같이 구하기 힘든 재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이 재료를 공유하는 것은 철저하게 공동 연구나 학생 교육 등 특별한 목적에 맞을 때 가능하다. 특히 환자 기록을 분석한 자료는 자료의 수집에서부터 IRB 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점은 물론 그 이후로도 주어진 규정을 잘 지켜 환자 기록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고, 단지 그 분석 결과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출판 후 또는 특허 등록 후 원자료는 얼마나 보관하여야 할까? 나중에 다른 연구자가 실험이나 자료 분석에 이의 제기를 하고, 특히 임상 자료인 경우 검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이런 면에 규정은 없으나 대개 5년은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종이 자료가 아닌 디지털 자료인 경우는 얼마든지 오랜 기관 보관이 가능하다.
자료의 인용방법
연구 후 학술 논문을 작성할 때 참고 문헌을 인용하는 것은 일상의 일이다. 또한 참고 문헌 인용이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할 때 가장 오류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의학 학술지를 통 털어서 참고 문헌을 인용할 때 전혀 오류가 없는 학술지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미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2006년도 학술지의 참고 문헌 분석 작업을 통하여 알려져 있다. 이렇게 참고 문헌을 인용할 때 오류를 일으키면 오류가 있는 문헌은 실제 저자가 기술하려고 하였던 바로 그 자료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 물론 오류의 유형에 따라서 분석하여 보면 실제는 어는 것을 인용하려고 하였는데 잘 못 기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적은 부분이지만 끝까지 도대체 무엇을 인용하였는지 알 수 없는 참고 문헌이 나오기도 한다. 이 경우는 결국 유령 자료의 인용이 되므로, 게재한 논문 자체의 과학성이 의심을 받게 된다. 물론 이런 것은 실수인 경우가 많고 고의로 참고 문헌을 오류로 기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자료의 인용에서 오류는 결국 그 논문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오류 여부는 학술지 체제 뿐 아니라 질 평가에서도 크게 차지하는 요소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는 출판 전에 저자의 참고 문헌 표기를 꼼꼼하게 점검한다. 이런 참고 문헌의 오류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웹에서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를 참고 문헌마다 기재하여 원문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면 상당히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DOI 는 국제적인 출판사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 세계 DOI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제 표준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를 의미한다. 웹 파일이나 인터넷 문서와 같은 모든 디지털 콘텐츠 마다 고유의 식별번호가 부여된다. 서적에 부여되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나 상품의 바코드와 같이 콘텐츠 자체에 부여하는 고유 식별번호로 지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콘텐츠의 계약·판매 등 전자상거래상의 모든 처리과정이 기록된다. 수시로 변경되는 디지털콘텐츠의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며, 불법적인 도용이나 침해를 방지해 거래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심사자 및 편집자의 역할
전문가심사(peer
review) 과정은 새로운 과학적인 사실을 인류의 업적으로 쌓는 과정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학술지 출판에서 꼭 거치는 작업이다. 예를 들면 서평, 초청 종설 등과 같은 내용은 특별히 심사 과정 없이 편집인의 판단으로 게재를 할 수 있다. 심사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편집인의 역할이 최소 기준에 맞는 논문을 선정하는 것과 같이, 심사자도 그 분야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내세울 수 있는 지를 판단하여 심사 결과를 편집인에게 보내는 것이다. 심사는 학술지 뿐 아니라 연구비 신청한 내용을 보고 연구비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도 수행한다. 또 한 예를 든다면 신임교원을 모집할 때 또는 승진할 때도 심사를 한다. 그러나 신임교원을 모집하거나 승진할 때는 대게 그 학술지 논문의 내용에 대한 오류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평판으로 심의하게 된다. 즉, 이미 출판한 내용을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심사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잡지 출판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고--> 편집인이 심의 여부 판단-->심의자를 추천 받거나 직접 심의자 선발-->투고 논문 심의 의뢰--> 게재 여부 판정 받음--> 심의 결과에 따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의 또는 게재 불가 판정 --> 수정 후 적절하면 출판 결정--> 인쇄소에 원고 넘겨서 조판(lay-out)-->
교정쇄 저자 교정 -->교정쇄 편집인 교정--> 최종 확인한 논문 인쇄소에 넘김--> 인쇄-->오류 여부 점검 --> 발송 목록에 따라 잡지 배송, 국제 색인데이터베이스에 발송 -->koreamed xml file을 의편협에 발송, 미국립의학도서관에 pubmed
xml 파일 발송.
이런 심의 과정에서 편집인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즉, 투고 받은 논문을 심의 할 것인 지부터 결정하고, 심의자를 결정하고, 최종 판단은 편집인의 몫이다. 또한 출판 전의 모든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고 오류 여부를 점검하고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 지 최종 점검도 편집인의 몫이다. 이런 작업을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s를 10년간 맡은 편집인 같으면 직접 하였다. 논문 수가 많으면 혼자 하기 어려워 부편집인을 여럿 두고 분야별로 점검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심의자의 역할은 물론 주어진 심의 규정에 따라 투고 논문이 그 학술지에 적절한지 심의를 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답을 하는 등의 임무가 있다. 이런 중에 어떤 윤리 문제가 있을까?
1)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 과정에서 낮게 또는 높게 평가하기.
예를 들면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 자신의 이론과 다른 내용을 투고하는 경우 낮게 평가하여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 자신이 일하는 분야의 연구비 신청 심사도 마찬가지이다.
2) 논문 심의 과정 중에 아이디어를 도용
심의할 때 수정 요구를 하며, 출판 기간을 늘여 나가면서 자신이 재빨리 일하여 출판하여 선취권을 확보한다.
3) 비밀 유지 위반
심의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여 그 내용에 대한 평을 편집인 이외 사람에게 하거나 바쁘다고 자신이 직접 심의하지 않고 실험실의 다른 구성원에게 심의하도록 하고 자신이 다시 평을 한다.
4) 투고자에게 지나치게 공격적
이런 행동을 하여 투고자의 기를 꺾어 다시 투고할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 감정을 배제하고 필요한 내용만 지적하여 가능하다면 비록 투고 불가라고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는 더 나은 내용을 투고할 수 있도록 투고자를 배려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 중 아이디어 도용과 같은 것은 전문직 윤리 규범을 넘은 일종의 범죄 행위이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에서 이런 심의 과정을 제대로 운영한 것이 언제부터일까? 기생충학잡지의 예를 들면 1980년 후반 퍼브메드 등재 후에 심의 절차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게 되었다. 과거에는 심의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의하는 예도 있었고, 게재 거절도 매우 힘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창립 초창기부터 심의 제도를 잘 운영한 학회도 있으나 심의 제도를 제대로 운영한 것은 1996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를 발족하여 학술지 평가를 할 때부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대부분의 학회에서 이 심의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하여 왔다. 물론, 일부 전문의 시험 전에 논문 발표를 필수로 삼은 학회에서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게재하는 경우가 일부 있으나 이 심의제도는 2000년대 들어서는 완전히 정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학술진흥재단에서도 평가를 시작하여 심의제도가 정착하는 데 일조를 하였다.
자료 및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이 매우 엄격하다. 그런 반면 법운용에서는 외국인이나 외국출판사의 저작권은 잘 보호를 하면서 국내인이나 국내 출판사의 저작권은 법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대학 사회에 만연한 국내 저작물 불법 무단 복사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복사업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처하고, 저작권자는 소송을 걸어 이겨도 그 보상 규모가 터무니없이 작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료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에서 병원의 환자 기록 또는 병원의 모든 기록은 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흔히 그 환자를 본 의사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엄밀히 말할 때 병원이 법인이라면 법인이 가지고 있고, 병원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한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의사가 병원에 채용될 때 특별히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의사가 병원의 월급을 받는 고용인이므로 다른 기업과 다를 것이 없다. 즉, 의사가 본 환자에 대한 기록, 모든 진단 및 치료 자료, 그 외 병원 활동에서 생긴 모든 디지털 자료 포함한 자료는 병원 소유자의 소유물이다. 즉, 어떤 의사가 자기 환자를 보고 기록한 것이라고 자기만이 그 자료를 모아서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누구든지 IRB 허락을 받고 환자의 기록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증례를 가지고 내과, 외과, 진단병리과, 영상의학과 등에서 각각 다르게 분석하여 증례 보고를 할 수 도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공동 작업을 한다. 특히 외부 연구자가 병원의 환자 자료를 가지고 data mining
작업을 한다면, 환자를 직접 본 의사가 반드시 공동연구자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어느 의사가 병원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학술지에 투고하면 그 분석한 자료는 원자료를 가공하여 만든 새로운 창조물이므로 저작권을 저자가 가지고 있다가 투고하면서 학술지 발행인에게 넘긴다. 가끔 학술지마다 정책이 달라서 저작권을 저자가 계속 가지게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학술지에서는 저자에게 그 대가로 출판 경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은 어디에 있을까? 저자는 투고 전에 저작권을 학회나 발행처에 이양하는 이양동의서를 작성하여야 출판이 가능하다. 이런 것은 국제 표준이다. 이 동의서는 책임저자가 혼자 작성하거나 공저자의 서명을 모두 받기도 한다. 이후의 저작권은 발행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학술지의 표나 그림을 사용하려면 저자가 아닌 발행인에게 요청하고 그 허락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논문의 저작권은 발행인에게 넘긴다 하여도 논문에 사용한 자료는 연구자의 업적이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는 중간산물이나 결과물로 특허를 낼 수 있다. 연구비 지원 기관 또는 소속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특허 등 자료의 저작권이 연구자가 아닌 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기관으로 넘어갈 때 계약 조건에 따라 나중에 수익금을 개인이 일부 수령할 여지가 있다.
출판 철회 절차(retraction)
퍼브메드나 코리아메드를 보면 retract 으로 검색하면 많은 논문이 나온다. 코리아메드 한 예를 보면 Fig. 1과 같다. 즉 저자가 스스로 또는 편집인이 어느 논문이 무슨 사유로 게제 철회한다고 기술하였다. 이 예는 Erratum이다. 즉, 어느 논문을 수정한다고 hyperlink 가 걸린다. 또한 그 게재 수정한 논문에 가보면 그 논문을 어디서 수정한다고 기술하였다고 표시한다.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The retention behavior
of ginsenosides in HPLC and its application to
quality assessment of Radix Ginseng. Hu P, Luo GA, Wang Q, Zhao ZZ, Wang W, Jiang
ZH.
Arch Pharm Res. 2009 May;32(5):667-76. Epub 2009 May 27. Retraction in: Arch Pharm Res. 2009 Jun;32(6):963.
이렇게 취소도 별도로 하나의 논문으로서 만들어야 철회할 수 있다. 그냥 철회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철회된 논문을 종이 잡지에서는 어차피 지울 수가 없고, web
database 에서도 그 논문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문은 그대로 남겨 두고 철회한다고 기술하는 것이다. 흔히 학술지에서 범하는 경우가 단지 Letter to
editor 또는 공지사항에서 어느 논문을 게재 철회한다고 기술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가 web database 에서는 철회가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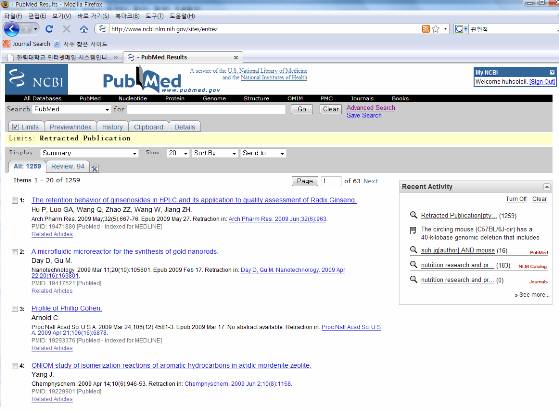
결론
그 동안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는 물론 대학원 과정에서도 연구출판윤리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새로운 과정을 통하여 다룬 내용은 연구 및 출판 윤리의 일부분의 내용으로 실험실이나 병원 현장에서 충분히 닥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이미 벌어진 일이다. 아무쪼록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하여 보고 자신의 일로 닥칠 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미리 궁리하여 둔다면 연구 및 출판 윤리의 국제 표준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 제도에서는 선진국이 아니라, 법과 윤리가 잘 구분되자 않은 나라이므로 윤리 문제가 개인의 취향으로 여기지 않고 법률을 잣대로 판단을 하여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특히 상류사회나 지식인에 대하여는 용인되는 사회이다. 윤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지켜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로 활동할 때,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윤리소개.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서울. 2006.
개별학습 문제
(6)
1. 병원에서 논문 조작이 일어난다면 가장 큰 이유는?
1) 학교에서 이런 일을 지적하여 처벌할 규정이 없다
2) 전공의가 연구비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교원이 승진할 때 논문 점수가 필요하다.
4) 전공의가 전문의고시 치룰 때 논문을 반드시 출판하여야 한다.
5) 자료 처리 등의 연구 윤리에 대하여 구성원이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
2. 병원의 환자 기록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
1) 아무도 주장하지 못한다.
2) 환자
3) 병원
4) 환자를 본 의사
5) 환자를 본 의사가 속한 교실
3. 참고 문헌을 디지털자료로서 인터넷 상에서 그
위치를 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1) Pubmed
2) Pubmed
Central
3) Koreamed
4) DOI
5) Crossref
4. 잡지 출판 과정에서 심의자의 최종 선정은 누가 하나?
1) 편집인
2) 부편집인
3) 편집위원
4) 발행인
5) copy editor
5. 다음 중 심의자가 지켜야 할 윤리 중 윤리를 넘어서 범죄 행위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1) 심의 거절
2) 비밀 유지 위반
3) 투고자에게 지나친 공격적인 평
4) 투고 논문의 아이디어 도용하여 논문 작성
5)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있는 논문을 게제 불가 또는 게재가 판정
6. 다음 중 출판 철회할 때 게재하여야 하는 출판 유형(publication
type)은?
1) 편집인에게 글(Letter to
editor)
2) 공지 사항
3) web 공지
4) 철회 이유 기술한 논문
5) 편집인의 글(Editorial)
모둠학습 문제 (5)-개별학습과 동일한 문항을 모둠이 같이 해결
사례 (6) 및 토의 과제 (2)
사례 1) ‘가’대학의 ‘나’교실의 교원은 수백 례의 환자 증례를 분석하여 논문을 작성하여 국제 학술지에 투고하면서 원하는 가정에 맞지 않는 예는 작성과정에서 제외하고 제출하여 매우 일관성 있고, 누가 보아도 뛰어난 성적의 보고이었다. 그러나 그 밑에 일하던 전공의는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으므로 나중에 다른 교실의 동료에게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였다. 그 사실을 들은 다른 교실의 동료는 그런 현실을 후배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 이때 고백한 전공의는 연구의 비밀을 누설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것인가, 아니면 전공의라는 신분 때문에 변조를 저지하지 못한 윤리 위반에 대한 고백으로 정당한 것인가?
사례 2) ‘다’ 대학에 새로 교원으로 발령 받은 ‘라’ 선생은 과거 ‘마’ 병원에서 전공의 과정 때 이중게재가 계속 맘에 걸린다. 즉, 그 때 지도교수로부터 외국 학술지에 발표하여 논문을 게재한 뒤 그 논문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국내 학술지에 내라고 지시를 받아서 우리말로 국내 학술지에 지도교수와 공저자로 출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가서 전공의 때 지도자에게 그 국내학술지 논문을 취소하자고 말하여야 할까? 아니면, 자신에게도 불이이익이 올 수 있으므로 가만히 있어야 할까? 문제는 국문 논문도 koreamed.org 및 google scholar를 통하여 모두 검색이 가능하다. 나중에 국제 학술지 편집인이 발견하여 문제 삼으면 더 곤란하여지지 않을까?
사례 3) ‘바’ 대학의 교원은 동료들과 모임에서 하소연하였다. 실험하는 대학원생에게 하는 일이 부족하다고 한 마디 하였더니 다음날 바로 그만 두겠다고 하고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병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꼭 연구 때문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전공의가 그만 두겠다고 하고 나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경우 대학원생이나 전공의가 문제일까 아니면 지도자의 인격이 문제일까?
증례 4) ‘사’ 대학에 근무하는 ‘아’선생은 논문 작성하면서 관련 자료를 살펴보다가 자신의 일과 유사한 일이 국제 학술지와 국내 학술지 두 군데에 같은 내용이 실린 이중게재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이 경우 두 논문 모두 다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먼저 출판한 국내 학술지의 논문을 인용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국제학술지만 인용하고 국내 학술지는 모른 채 할 것인가? 아니면 둘 다 나중에 다 게재 철회가 된다고 여기도 둘 다 인용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투고 후 심의위원이 혹 왜 과거 유사 업적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이중게재라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가?
증례 5) 치매 연구에 관한 국제적으로 대가인 ‘차’ 선생은 최근 국제 학술지로부터 종설 집필 요청을 받고 투고하여 게재한 뒤, 논문 게재 철회 신청을 하였다. 그 이유는 논문 수정 작업 중 참고 문헌 하나를 빠뜨려 다른 연구자 논문의 글이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한 문장 이상 실렸기 때문이다. 편집인은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사례 6) Advances
in Parasitology 라는 기생충학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종설 학술지에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저자가 기생충학잡지의 그림을 다시 그려서 실으면서 기생충학잡지 편집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저자도 확인하였으나 기생충학잡지의 어디에 있는 내용이라고 기술하여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영국 저자는 왜 기생충학잡지 편집인이나 발행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까? 내가 기생충학잡지의 편집인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일까?
토의 과제
1) 지도자와 훈련생의 관계를 문서로 정리하여 관계를
시작하지 전에 합의할 수 있을까?
2) 어느 지도자와 훈련생이 좋은 rapport
형성하고 일을 잘하는지를 기관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동물실험계획서 신청 및 심의
Submission
and Review of Proposal for Animal Experiment
☞ 학습 목표
동물실험에서 윤리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 구체 목표
1) 동물실험 수행할 때 지켜야할 법령을 두 가지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2) 동물실험 관련 각 법령의 기본 정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제출할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동물실험 계획서의 심의 기준 및 절차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법률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동물보호법(제8282호, 2008년 1월 27일 시행)이고, 둘째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주관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9025호, 2009년 3월 29일 시행)이다. 동물보호법의 기본 정신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이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정신은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 확보이다. 동물보호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54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부령 제1575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세부적인 사항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370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은 현재 준비 중에 있다.
동물실험을 수행 예정인 모든 연구자는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동물실험계획서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이 된 후에 동물실험을 진행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된다. 한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8-4-19)은 2008년 9월 25일 제정 되었으며, 한림대학교 중앙실험관 실험동물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다. 본 워크숍에서는 동물실험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동물실험계획서의 작성, 동물실험 계획서의 심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토의하고자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08. 9. 25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법률 제8282호)에 의거하여 한림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중앙실험관 실험동물부 내에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위원회는 이 대학교에 있는 각종 동물실험시설 (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 교육과 연구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 동물실험이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동물실험계획서 심사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규정 및 시설 이용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시설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시설 실사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동물실험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 3 조 (적용범위) 이 대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 조사에 관한 심의 , 교육훈련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 한다.
제 4 조 (구성) 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험동물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1.「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② 위원은 실험동물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간사는 관리운영실장이 된다.
제 5 조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① 동물실험계획서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1인 이상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위원회 외부에서 자문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 6 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회의를 서면 또는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도 있으며, 모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권한 및 책임)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반기별로 시설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시설이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심의) ① 이 대학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동물실험계획서(서식1)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동물실험계획서 또는 변경신청서(서식2)는 규정에 따라 분류하여 위원들에게 검토를 의뢰하되, 위원 중에서 담당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검토 의견(서식3)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신속, 정확하게 심사(서식4)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서면(서석5)으로 통보한다.
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2. 실험담당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3. 실험동물종의 선정 및 사용 동물수의 적합성과 타당성
4. 저침습성 처치, 조직배양 등 대체방법에 의한 해당 동물실험의 대체 가능성
5. 적절한 진정, 진통 및 마취법의 수행
6. 인도적인 실험종료 및 안락사를 취하기 위한 기준 설정
7. 동물실험 경험 및 훈련 여부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의와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결과를 승인, 보완 및 수정, 부결로 결정한다.
⑤ 심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심의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9 조 (승인 및 조치) ① 동물실험 진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승인된 동물실험신청서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한 경우는 이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연구책임자가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동물시설에 대하여 폐쇄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10 조 (심의경비 부담 및 예산지원)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 (규정개정) 이 규정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동물실험계획서
동물실험계획서
본 동물실험계획서는 한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에서 심의합니다. 관련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및 승인 여부는 추후 개별 통지됩니다.
일련번호: 접수일자 : 200
. . .
|
연구책임자
|
성명 (한글)
|
성명 (영문)
|
소 속
|
직 위
|
연락처
|
연구책임자
|
|
|
|
내선)
C.P)
|
연구책임자
E-mail: |
실험동물시설
이용자 등록번호
|
|
|
|
|
|
|
|
|
|
2-1.
연구과제명
|
한글
|
|
2-1.
연구과제명
영문 |
|
|
2-2.연구과제
|
□신규과제 □연속과제 □일반연구 □기타( )
|
2-3. 연구비지원기관
|
|
|
2-4. 연구비
|
□교비(실험실습비) □국책과제 □산업체연구비 □기타 연구비
|
|
2-5. 연구 목적 ( ※ 일반적 기술,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게 간략하게 기술)
|
|
|
|
2-6. 학생 교육과목명 :
|
|
학생 실습내용 :
|
|
|
|
|
|
|
성명(한글)
|
영문
|
직 위
|
소
속
|
실험동물시설
이용자 등록번호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동물실험의 형태 선택(해당 사항 모두 Check).
|
|
□ 재료채취 □ 외과적 처치 □ 유전∙육종 □ 방사선 조사 □ 감염 □ 발암 □ 행동관찰
|
|
□ 기타( )
)
|
|
4-2. 특별한 주거(Housing) 및 사육조건 필요 유무
(예, Restraining Devices,
Radioactive Materials/ Other Biohazards, Infectious Disease)
|
|
(예시) 실험동물의 절식, 장기간 고정하는 경우 등 일반적인 사육 조건이 아닌 경우 이유와 함께 방법을 자세히 기록
|
|
4-3. 저침습성 처치, 조직배양, 컴퓨터 모의시험 등에 의한 해당 동물실험 대체 가능성 여부
|
|
(예시) 대체 가능성이 없음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하였는지(문헌검색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
|
5. 동물 종 및 실험기간
|
|
|
5-1. 사용 동물 종 (해당사항에 Check)
|
|
□
Mouse □
Rat
□ Guinea Pig
□ Rabbit
□
Hamster □
Dog
□ Cat
□ Pig
□ Gerbil
|
|
□ 기타 (
)
|
|
5-2. 세부내용
|
|
계통명
|
|
동물구입처
(구입당시)
|
|
|
5-3. 실험동물 품질구분 (SPF인 경우 Health Monitoring 기록서 첨부 요)
|
|
□
SPF(Specific Pathogen Free) □
CL(Clean) □
CV(Conventional)
□ Germ
Free
□ Gnotobiotic □ 무 확인
□ 기타
|
|
5-4. 실험동물 규격
|
|
체중: ㎏ g
|
주령
weeks
|
pregnant
days
|
마리수 ♂ ♀
|
|
5-5. 실험기간 및 장소
|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사육장소
|
|
|
해당년도 초과하여 실험이 진행될 가능성
|
□ 있다
|
□ 없다
|
|
|
|
|
|
|
|
|
6. 동물종의 선택 및 실험 방법
|
|
6-1. 해당 동물 종을 선택한 합리적 이유
|
|
(예시) 노화실험에 사용하는 마우스는 C57BL/6J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일한 동물을 사용하여 발표된 논문으로는 Science, 323:130-133 등이 있음
|
|
6-2. 사용동물 수에 대한 합리적 근거 사유
(5-4에 근거하여 구체적 산출근거로 제시하고 통계학적 근거도 제시 해야 함)
|
|
(예시) 5-4에서 30마리로 기록한 경우 대조군(10), 실험군Ⅰ(10), 실험군Ⅱ(10) One-way ANOVA test로 통계처리 할 경우 최소한의 마리수임.
|
|
6-3. 실험동물센터 이외의 장소로 동물의 반출, 연구 혹은 외부 연구시설에서 동물을 반입할 경우 필요 사유
|
|
(예시) 본 시험은 의과적인 처치 후에 RIC에 있는 Animal-CT를 주기적으로 촬영해야 함.
|
|
6-4. 실험방법 (프로토콜, 약품명 및 용량 을 구체적으로 기록)
|
|
- 동물실험 및 sampling에 관한 내 용
|
|
- 외과적 처치를 포함하는 실험인 경우, 수술방법(기타)
|
|
7. 동물 실험 통증, 스트레스의 정도 및 통증, 마취방법
|
|
7-1. 무마취하에서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의 정도(해당사항에 check)
|
|
□ A : 원생동물, 무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
□ B : 척추동물을 사용하지만 거의 고통을 주지 않는 실험
□ C : 척추동물에게 약간의 스트레스 혹은 단기간의 작은 통증을 주는 실험
□ D : 척추동물에게 회피 할 수 없는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주는 실험
□ E : 척추동물 (무마취)에게 忍耐限界에 근사하거나 그 이상의 통증을 주는 실험
* 등급 E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자료 별첨
|
|
7-2. 진정, 통증 및 마취방법
(7-1. 항목의 등급 D 또는 E를 선택할 경우 ①용량 ②횟수 ③투여방법 ④구입처 등을 기술)
|
|
(예시) ① 20% 우레탄을 ② 1회 0.7ml ③ 복강주사 시행 ④
우레탄을 비향정신성 시약으로 구입
(향정신성인 경우 구입처 반드시 표기)
|
|
※ 마취제(Anesthetios)와 근이완제(Paralytic Agent)를 병행하는 경우(병용 사유)
|
|
8-1. 수술 후 관리방법 (해당사항 모두 기록, 반드시 약품명, 용량 횟수를 기록)
|
|
(예시) 켄타마이신, 0.2ml(80mg/2ml), 1일 1회
|
|
8-2. 동물에 극도의 통증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결과가 예상될 경우, 적절한 중재, 인도적인
실험종료 (Hamane
endpoints) 또는 안락사를 취하기 위한 기준
|
|
(예시)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식욕부진으로 체중이 20%이상 감소한 경우 인도적 실험종료를 실시할 예정임
|
|
8-3. 안락사 및 처리방법(마취제 등의 약제, CO2 가스 사용, 경추 탈구, 경추절단 등) 자세히 기술
|
|
(예시) Co2 가스사용을 추천
|
|
8-4. 실험자를 위한 작업환경의 안전성 확보 여부
|
|
(예시) 동물실험 예정인 000는 한림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실험동물시설이용자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연구책임자가 동물실험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을 하였으며, 적절한 보호장치(마스크, 안경)를 사용할 예정임
|
|
8-5. 실험물질의 유해성 여부 및 특이사항 기재 (유해물질인 경우 시험물질 정보지 첨부)
|
|
(예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성 여부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하며, 유해성이 있는 경우는 8-4에서 적절한 안정조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
8-6. 동물실험을 대체할 연구방법 등 조사 자료 및 해당 실험이 불필요한 중복 실험이 아님을 기술
|
|
※ 혹은 대체방법이 있으나 적용이 어려운 사유 기술, 탐색 경위 등 기술
(예시) 수행예정인 실험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중복실험이 아님을 조사 하였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 해야 함 (문헌검색 등)
|
윤리적 동물실험방법의 준수(서약서)
1. 나는 한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규정 및 동물실험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입니다.
2. 나는 동물실험계획서에 제시한 실험방법에 따라 실험을 수행할 것이며, 실험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계획 변경을 신청하겠습니다.
3. 나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며,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 안락사 등을 포함한 실험동물 기술원(수의사 포함)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실험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은 실험동물시설 이용자 교육을 이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바르게
이행할 것이며, 위 사실을 위반 할 경우 실험동물시설의 이용제한을 포함한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0 년 월 일
|
구분
|
성명
|
소 속
|
실험실명
|
내
선
|
날 인
|
|
연구책임자
|
|
|
|
|
|
|
연구원
|
|
|
|
|
|
|
연구원
|
|
|
|
|
|
|
보조연구원
|
|
|
|
|
|
|
연구원
|
|
|
|
|
|
![]() Creative
Commons License
Creative
Commons Licens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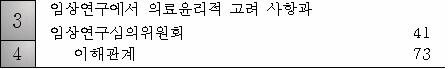
![]()
![]()
![]()
![]()
![]()
![]()